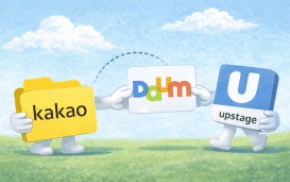우리나라에서는 전자책 단말기가 성공할 리 없다는 통념이 결국 가격 실험으로 깨졌다.
6만4천500원. 인터파크도서가 전자책 단말기 '비스킷'의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자 소비자도 곧바로 반응했다. 발매 하루만에 1천대가 팔려나가며 남아 있는 재고 4천대를 닷새 만에 소진했다.
지난달 교보문고가 아이리버와 손잡고 선보인 '스토리K'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선 처음으로 10만원 가격대를 깬 이 제품은, 한 달 간 약 1만여대가 판매되는 인기를 끌었다.
지난 5년간 국내 보급된 전자책 단말기는 5만여대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짧은 기간 1만4천대가 판매된 것은 놀라운 성적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컨버전스 기기만 흥하는 시대, '책'만 보라는 아날로그 단말이 소비자 눈길을 끌리 없단 편견을 깼다.
물론 최근 성적을 가지고 당장 전자책 단말기가 새 시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322만대.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하면 하루에 8천800대씩 팔린 꼴이다. 날개돋힌 듯 팔리는 스마트폰과는 비교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그럼에도 전자책 업계는 '반값 단말기'에서 희망을 본다. 우선 소비자들이 '저가'라면 전자책 단말기도 별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한 셈이다.
인터파크도서 관계자는 "전자책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독자 저변이 넓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가 보급률이 늘어나고, 독자들이 콘텐츠를 구매하기 시작하면 전자책 시장도 더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전자책 시장은 지난 10년간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호재도 많았다. 스마트폰·태블릿이 보급되면서 주요 이동통신사와 도서 유통업체, 출판사 등이 모두 전자책 사업을 시작했다.
교보문고는 연초 종이책 베스트셀러 10위권 내 도서 중 절반이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전자책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단말기 판매가 늘었으니 '전자책 훈풍'이란 표현도 충분히 나올만 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사업자도 늘었고, 소비자들에 통하는 단말기 가격대도 시험을 통해 검증했다. 부족하긴 하지만 콘텐츠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반값 전자책 단말기는 성공했지만 인터파크도서는 당분간 추가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가격으론 이윤을 남기기 힘들어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저가로 계속 제품을 만들긴 힘들어서 한정수량으로 판매했다"고 말한다.
아이리버의 경우 스토리K를 팔아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이윤은 전자사전보다도 적다. 교보문고와 콘텐츠 판매 대금 일부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단말기 사업을 지속하긴 힘들다. 아마존 킨들 같은 전자책 단말기 히트상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저가 단말기를 만들어 팔아 수익을 내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와 연계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사업을 지속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전자책 시장이 더 커지려면 전용 단말기도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만 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저가 단말기를 계속 만들어낼 것인가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관련기사
- 전자책 단말기 '비스킷' 반값 판매 했더니...2012.02.22
- 아이리버 전자책, 4천대 완판 '인기'2012.02.22
- 애플 아이북스2.0, 전자책 업계에 '독사과'?2012.02.22
- 전자책, 국내서도 9만9천원 통했다2012.02.22
스토리K의 성공에도 아이리버는 침착한 분위기다. 반값 단말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전자책 시장 성장을 위한 고민이 더 큰 탓이다.
앞으로 10년. 전자책 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반값의 함정'을 넘어야 한다. 가격 외에 스마트 기기가 주지 않는 효용을 찾아야 한다. 단말기 때문에 콘텐츠를 더 보고, 콘텐츠를 보다 보니 단말기가 필요한 선순환 구조를 업계가 만들어 내야 한다. 전자책 업계가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