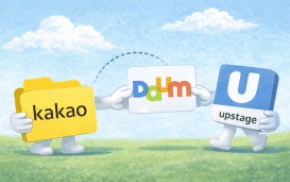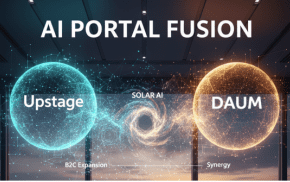상반기 방송계를 뒤흔들던 지상파 3DTV 방송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올해 초 영화 아바타의 대흥행 후 한국은 3D열풍에 휩싸였다. 가전업체, 방송사, 정부, 국회 등 전분야에서 3D관련 이슈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하반기에 이르러 그 열풍은 스마트TV로 옮겨간 모양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고화질 지상파 3DTV 방송을 정책 주요과제로 삼고 대대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며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었다.
결국 5월부터 지상파 방송 4사(KBS, MBC, SBS, EBS)는 3DTV 실험방송을 실시했다. 66번 채널을 통해 남아공 월드컵을 비롯, 각 방송사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등을 방송했다.
하지만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실험방송을 접한 실제 시청자수가 미미했고, 3D 콘텐츠도 월드컵 외 특별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송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성급히 나섰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콘텐츠 제작여건이나 방송송출, 시청안정성 검증 등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송사 “3D방송에 대대적인 투자 없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3D 방송 준비상황은 상반기와 다르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 3D방송은 여전히 연구개발 단계”라며 “제작설비 구축이나 본방송용 콘텐츠 제작도 현재 계획이어 없다”고 말했다.
그는 “3D와 관련해 연구개발쪽 외에 편성제작 부분은 특별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3D 콘텐츠 제작에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EBS가 교육용 3D영상물을 제작중이며, KBS 등 나머지 3개사도 콘텐츠를 제작중이다. 그러나 이는 실험용에 불과해 시청자에게 실제로 선보이기에는 부족하다.
이같은 상황의 기본적인 원인은 역시 돈이다. 3D 콘텐츠 제작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초기비용이 들어간다. 3D 카메라 1세트만도 10억원이다. 이밖에 3D 중계차, 조명장치, 편집장비 등 모든 것을 새로 갖춰야 한다. 콘텐츠 제작비용도 기존의 4배 이상 소요된다.
수익모델도 여전히 마땅히 준비된 것이 없다. 거액의 투자비용에 비해 광고료는 기존과 똑같다. 콘텐츠 재판매가 한 방법이지만 판매처가 마땅치 않다.
■방통위, 10월 실험방송 준비는 그대로
방통위는 다음달 또다른 3DTV 실험방송을 준비중이다. 지난 실험방송이 3D방송을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은 기술적인 보완점 찾기가 목적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실험방송은 시중의 3DTV가 아닌 셋톱박스를 통해 3D방송과 2D방송을 한개 방송채널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실험방송 시작은 다음달 마지막주로 잡혔다.
시판된 3DTV로는 실험방송을 이용할 수 없고 방통위가 개발한 별도 셋톱박스가 필요하며, 셋톱박스는 일반가구와 공공장소 등 100여곳에 시험 보급된다. 때문에 일반 시청자는 실험방송을 볼 수 없다.
이번 실험은 2D영상과 3D영상을 한 채널로 동시에 송출하고 시청자가 영상을 선택해 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통위 측은 “현재 장비개발을 마치고 사전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실험방송 시작전까지 시스템 최적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방송은 방통위가 대부분을 주도하고 KBS 등 방송사는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기사
- 3D TV 가격파괴···"대중화 시작됐나?"2010.09.28
- 삼성, 3D TV '100만대' 팔았다2010.09.28
- "향후 4년간 인터넷TV가 3DTV 압도"2010.09.28
- 3D방송 시청자 "관심 높지만 어지럽고 불편"2010.09.28
지상파 방송사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상파 3DTV 방송을 실현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다”라며 “시청자에 설익은 콘텐츠를 선보였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D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회자되지는 않더라도 방송의 추세가 3D를 거쳐가는 것은 맞다”라며 “스마트TV로 관심이 넘어가 오히려 진지한 준비가 가능해진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