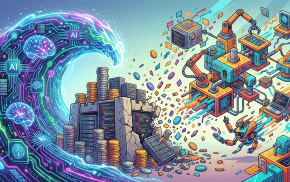케이블TV 통신사업에 위기의 그림자가 짙다. 방송에 이어 통신사업마저 가입자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 이동통신사업 진출로 재도약을 노리지만 논의만 무성해 미래가 불확실하다.
케이블TV의 초고속인터넷은 사업초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가입자를 빠르게 끌어 모았다. 방송통신결합상품을 통해 통신사 인터넷상품보다 3배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덕분에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이 17%를 넘는 결과를 거뒀다.
하지만 케이블TV의 통신사업은 현재 성장엔진을 멈췄다. 통신사가 월 5만명씩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반면, SO는 신규가입자 순증이 거의 없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천671만여명으로 KT 716만명(42.9%), SK브로드밴드 388만명(23.3%), LG유플러스 261만명(15.6%), SO 283만명(17%)이다. 4월과 비교하면 3대 통신사가 4만7천명 증가한 반면, SO 가입자는 88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통신사 공세에 방송통신결합상품 경쟁력 한계 노출
요인은 전반적인 유선통신시장이 가입자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크다. 다만, 통신사들이 꾸준한 순증 가입자를 모으는 것과 비교해 케이블TV의 사업은 정체수준이 심각하다.
SO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고전하기 시작 것은 통신사의 역공이 거세지면서부터다. 통신사들이 IPTV사업을 시작한 후 결합상품의 구성면에서 케이블TV와의 차이점이 사라졌다.
또한 케이블TV가 갖지 못한 이동통신이 결합상품에 포함되고, 약정에 따라 요금할인과 현금, 사은품, 무료이용기간 등의 혜택을 제공해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렸다.
여기에 통신사의 풍부한 자금력, 전국적인 영업망, 현금마케팅 등이 SO를 압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O의 통신사업은 가입자가 줄지 않는 것만도 기적”이라며 “속도, 부가서비스 등에서 가입자 밸류를 높이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SO가 보유한 초고속인터넷망의 속도도 문제였다. 통신사가 100Mbps급 광랜을 중심으로 속도경쟁을 벌인 반면 SO 대부분은 기존 10Mbps급 상품만 유지했다.
그나마 MSO인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HCN 등은 지속적으로 망고도화를 진행해 160~200Mbps급의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지만 MSO 사업권이 아닌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장 큰 약점은 투자여력이다. 망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SO 중 이를 감당할 곳은 극히 드물다. 대기업이 소유한 MSO가 꾸준히 망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만, 그 범위도 방송사업권역에 한정될 뿐이다.
가입자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권 범위를 넓히는 것이 있다. 사업권을 벗어나 전국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SO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전국사업에 법적인 걸림돌은 없다. 다만, 전국에 최상급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자금은 MSO로서도 부담이다.
MSO 관계자는 “새로 인수한 SO에 실사를 나가보면 낙후된 설비에 놀라기 일쑤”라며 “기존 권역의 망업그레이드와 신규사업권의 투자까지 겹쳐 자금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야심의 MVNO는 사업자마다 ‘동상이몽’
케이블TV업계는 결합상품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MVNO사업 진출을 수년간 외쳐왔다. 이동통신과 단말기 유통능력을 가져야 통신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9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MVNO사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현재까지의 MVNO 자체에 대한 쟁점은 도매대가 산정, 의무제공사업자 문제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개정을 눈앞에 두고 신규 MVNO사업자의 이윤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준비중인 고시안의 도매할인율은 30%로 사업자의 판매마진을 보장하기 어렵다.
가령, MVNO사업자는 MNO로부터 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해, 여기에 판매마진을 붙여 휴대폰을 판매한다. 이렇게 되면 최종 소비자가 접하는 요금은 기존 이통사와의 차이가 별로 없게 돼 사업성은 떨어진다.
여기에 케이블TV업계는 SO 사업자간 이견을 드러내며 순탄치 않은 진행을 보인다.
현재까지는 기존 한국케이블텔레콤(KCT)를 통한 공동사업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하지만 KCT 지분을 80%이상 보유한 티브로드와 타SO들 사이에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암투가 진행중이다.
사업모델을 놓고도 골이 깊다. 음성통화를 중심으로 한 이동전화, 데이터통신을 활용한 비디오 서비스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더딘 진행속에서 케이블TV진영의 MVNO 사업자가 두개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돈다. 급속도로 규모를 키운 MSO 일부가 독자행보를 걷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MSO라 하더라도 사업영역의 한계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케이블TV SO는 법적으로 전국 30%를 넘는 방송사업권역을 가질 수 없다. 이동통신의 경우 전국사업이 가능하지만 영업망 부족, 결합상품 구성 불가능 등이 독자사업을 막는다. 기존 권역 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가입자가 적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관련기사
- 케이블TV-지상파, 광고규제 분리되나?2010.08.04
- 벼랑 끝 케이블TV, 국회에 SOS2010.08.04
- [사스포칼립스 위기 ㊤] AI가 SaaS 산업 흔드나…"경쟁 구도 재편으로 봐야"2026.02.26
- 밀가루·설탕값 내렸는데…오리온·농심·롯데 조용 왜?2026.02.26
이에 대해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일단 MSO들이 기가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전화도 선방하고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라며 “지역의 개별SO들도 과거와 달리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인 만큼 희망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MVNO사업은 사업모델을 얼마나 잘 구상하느냐가 성공을 결정짓기 때문에 논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