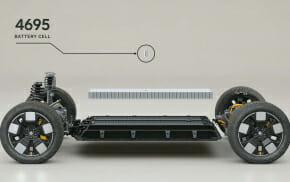길이를 재는 것은 자(尺)이고 무게를 다는 것은 저울이다. 자와 저울에도 오차가 없진 않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어서 모두가 믿고 쓸 것이다. 법(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어쩌면 사회를 재는 자와 저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기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믿고 따라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법에 대한 신뢰는 자와 저울에 미치지 못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법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이 표현은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 전(錢)은 돈 혹은 자본을 가리키지만 권력이나 관계가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다. 요컨대 자와 저울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믿기지 않는 것이다. 한 유명한 정치인은 이를 비꼬아 ‘법은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책을 내기도 하였다.
돈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에겐 언론도 법만큼이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법을 조롱하는 말이라면 언론을 불신하는 표현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이 말은 원래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중립적인 의미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만 쓰이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자기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을 지적하는 말로 더 쓰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자와 저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 분야에서 자와 저울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현령비현령이 방송 언론의 속성일 수 있고, 권력은 늘 이를 이용하려는 욕망에 빠지기 때문이다. 행정기구 가운데 특별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로 만든 이유는 그 욕망을 견제하자는 뜻이겠다.

방송 장악을 주권(主權)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은 독일의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다. 그는 “주권자는 비상사태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라는 유명한 논리로 히틀러식 총통 독재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다. 슈미트는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후 그 유명한 문장을 “주권자란 공간의 파동들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로 수정했다. 80년 전에 이미 권력의 방송 장악 중요성을 주권 논리로 설명한 셈이다.
이 정부 들어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두 번이나 탄핵과 사퇴를 반복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을 지켜보며 새삼 슈미트의 빛나는 정치 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로의 욕망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자제하고 정치적 예술로 합의를 이끌어 내보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겠다. 그러나 정치는 없고 이판사판의 전쟁만 지속되는 형국이 됐다.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MBC의 ‘100분 토론’을 쭉 지켜봤다. 토론은 그냥 일진일퇴의 이현령비현령에 불과했다. 원래 5인 체제(대통령 추천 2인, 여당 1인, 야당 2인)로 돼 있는 위원회가 10개 월 가량 기괴한 2인 체제(대통령 추천 2인)에서 중요한 사안을 무리하게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논란의 배경일 터이지만 해법을 기대하는 건 허망한 일로 보였다.
토론은 시종일관 책임 공방이었다. 양쪽 다 한때 잘못했으면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며 다람쥐 쳇 바퀴 돌 듯 상대방 책임만을 추궁했다. 토론 패널에는 여야가 번갈아 가며 공영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들 때 거기에 소속돼 있던 기자 출신도 2명 있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아픔을 공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서로 각각 다른 진영의 전사(戰士)가 되었다. 그 아픔은 다시 후배에게 넘겨지겠지.
그들은 왜 그럴까. “방송은 6.25 전쟁 때로 치면 백마고지와 같은 것입니다.” 기자 출신 2명이 아닌 다른 한 패널이 들키지 말았어야 할 속마음을 아마도 무심코 뱉은 이 말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듯 했다. 그렇구나. 이건 전쟁이구나. 공영방송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6.25 전쟁 말기에 양쪽 합쳐 1만3천명이 전사하며 12 차례나 뺏고 뺏겼다던 그 험악한 전투에 임하는 자세와 같은 것이구나.
관련기사
-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콩나물시루 물주기2024.07.01
- 이동통신 서비스는 다시 시장 경쟁 상품이 될 수 있을까2024.06.24
- 쿠팡은 왜 잘못하고도 소송까지 하려는 걸까2024.06.17
- 라인야후 사태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착각2024.06.10
토론에서 나온 백 마디 다른 말보다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온 까닭은 참으로 부끄러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주소가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어떻게 정치적 예술로서의 합의가 꽃피울 수 있겠는가. 슈미트의 생각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결국 옳은 이야기란 말인가. 공영방송의 기자와 PD는 백마고지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총알받이라는 말인가.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자 출신 새 전사(戰士)가 다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