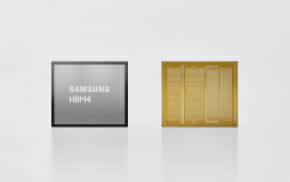최근 강의를 나갔다. 수강생이 쓴 글을 고치면서 난 기사란 무엇이고 기사 쓰기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글쓰기에 재미가 생긴 수강생의 눈빛에 감동을 받았다. 수강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사회취약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관성적으로 일하듯 기사를 쓰고 있던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지식을 전해주어야 함에도 도리어 더 많은 것을 받아버렸다. 이후 새삼 직업으로써 생계의 수단이 된 기자라는 직업과 기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민은 어떤 기사를 써야할 것인가로 이어졌다.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기사를 쓴다고 뭐가 바뀌긴 하던가.
몇 년 전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다. 대학원 입학 비리가 의심되는 사건이었다. 여러 교수들이 학생의 입학에 관여한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주변 교수를 인터뷰하고 시험지도 입수하면서 사실관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사를 여러 번 썼다. 기사 내용이 복잡하니 기사를 풀어 설명한 해설 기사까지 썼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하나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기관의 블랙리스트 맨 윗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귀띔 하나만 있었다. 최근 TV에 유력한 공모자 가운데 한 명이 전문가로 출연한 것을 보았다. 그렇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사회 지도층이 감옥 대신 병원에 머물다 슬그머니 풀려나는 과정에서 누가 관여했으며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폭로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보건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기사를 삼년 넘게 썼지만 반응은 없었다. 정신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는 5년째 쓰고 있지만 변화는 미미하다.

이쯤 되면 기사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허무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은 어쩌면 기자라는 직업을 고른 선택의 결과일 것이고, 허무주의에 딸려온 우울은 짊어져야 할 짐일 것이다. 이런 감정의 여파로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질까 두려워하는 것도 내 몫일 터다.
그런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매체 소속 저널리스트들도 이런 우울함에 시달리나 보다. 영화 ‘그녀가 말했다’는 할리우드의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를 추적한 뉴욕타임스의 취재 과정을 영화화했다. 허구의 산물일 테지만 영화 속 뉴욕타임스 기자들도 극심한 허무주의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기사를 쓴다.
작중 성범죄를 폭로하고 가해자에게 되려 소송당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는 후배 기자의 질문에 선배는 이렇게 대꾸한다. 변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한다고.
이 말이 귀에 꽂혔다. 사실 변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 더러 기만적이기도 하다. 변화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사로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상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 적당히 참고 잊어버리라거나 잘 지내보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럼에도 아직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변할 수 있다고 설득당하고 싶다. 백날 기사를 써도 대체로 변하는 것은 없지만 변할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득되고 싶다. 허무주의와 싸우고 우울을 누르면서, 기사 하나가 어쩌면 많은 것을 바꿀 지도 모른다는, 그런 종교 같은 믿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