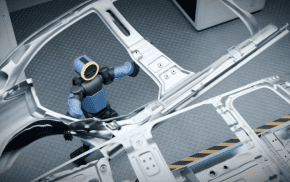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압사 위기에 처한 시민을 끌어 올리고 심폐소생술(CPR) 하는 등 많은 이의 생명을 구하고 사라진 3명의 주한 미군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AFP 통신은 이태원 참사를 직접 보고 겪은 자밀 테일러(40), 제롬 오거스타(34), 데인 비타드(32) 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 미군 주둔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전날 비번을 맞아 이태원에 방문했다.
당시 이들도 사고 현장인 좁고 가파른 그 골목길에서 인파에 휩쓸려 있었다가 간신히 옆에 있던 난간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세 사람은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구조에 나섰다.
테일러는 "우리는 (체격이) 작지 않지만, 우리도 빠져나오기 전에 인파에 깔리고 있었다"며 "모든 사람이 도미노처럼 서로의 위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사람 위에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있었고, 현장에서 도울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깔린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비명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세 사람은 깔린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올린 뒤 마침 문을 열었던 인근 클럽으로 보내 응급구조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도록 했다.
비타드는 "우리도 (많은 인파로) 불안해하고 있었고, 당시 그 중간 위치에 있었다. 우리가 옆으로 피하자마자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들이 골목길에 꽉 차 있어서 응급 구조대원이 붐비는 군중 속에서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기가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밤새 깔린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도왔다고 밝힌 비타드는 "그 안에 깔린 사람들은 오랜 시간 숨을 쉬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거스타는 "많은 여성이 군중 속에 깔려있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체격이) 작았기 때문에 횡격막이 부서진 것 같았다. 이들이 공황에 빠져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웠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늦은 때였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세 사람에 따르면 참사 현장에 경찰이나 구조대원이 거의 없었고, 많은 인파 탓에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재앙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관련기사
- 재유행 성큼…"2주 뒤 최대 12만명대 확진" 전망2022.11.04
- 삼풍 생존자 "그땐 YS 사과...국가가 책임져야"2022.11.04
- 손흥민, 48시간 안에 수술…"월드컵 출전, 회복에 달려"2022.11.04
- "유기농 냉동만두에서 '목장갑'이 왜 나와?"2022.11.03
끝으로 이들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다. 우리가 현장을 떠날 때쯤에는 모든 곳에 시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