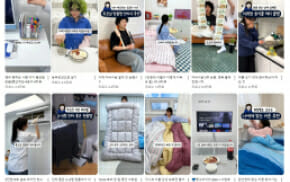“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장은 프란츠 카프카가 그의 대표작 ‘변신’이 실린 책의 머리말에 적은 것이라고 한다. 나는 이 문장을 박웅현이 쓴 ‘책은 도끼다’에서 처음 봤다. 이 문장은 그야말로 도끼처럼 내 정신을 내리찍었다. 내 정신은 순식간에 두 쪽으로 갈라졌고, 거기서 오물 같은 쓰레기가 쏟아지는 걸 느꼈다.
그 앞 문장이야 말로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였다. “우리가 읽은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그 책을 읽는 거지?” 적지 않은 책을 읽었지만 그 책으로 인해 나는 과연 잠에서 깨어나 있는 상태인가. ‘꽁꽁 얼어버린 바다’ 같은 정신과 마음에서 해방된 적이 과연 단 한 순간이라도 있었나. 불행히도 두 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그 동안 나는 어떤 책을 왜 읽었던 것이지? 그리고 쑥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도끼여야 마땅할 그 수많은 책이 그동안 나에겐 내 정신을 위장하는 화장품에 불과했다. 삶을 살수록 더럽혀지는 내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치료한답시고 책을 읽으며 정신을 화려하게 치장했다. 정의와 열정 같은 긍정의 언어로 정신을 무장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줄 믿으며.
문제는 그럴수록 깨끗한 마음에 대한 갈증이 더 커지고 한 여름 뙤약볕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은 더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는 사실이었다. 정의와 열정 따위의 모든 올바름에 대해 그토록 심취했는데 왜 마음은 선(善)의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기만 하는 걸까. 공부는 곧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일 텐데 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순진무구한 아이의 모습에서 누추한 노인의 표정으로 변할까.
실로 난감한 문제 아닌가. 올바름에 관한 책을 읽고 그걸 정신에 새긴 뒤 그 올바름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쓸수록 마음은 더 혼탁해지니 대체 그 올바름이란 약이란 말인가, 독이란 말인가. 이 의문에 도끼가 되어준 책이 있다. 정혜신이 쓴 ‘당신이 옳다’. 이 책을 읽고서야 내가 사람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존재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올바름은 순식간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사람의 마음은 알고 보면 상처투성이다. 매일 깨진 유리 조각에 긁히고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문제는 ‘깨진 유리 조각’이 거악(巨惡) 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은 멀리 있는 거악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모든 올바른 것들에 의해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 엄한 아버지나 선생님 그리고 직장 상사의 올바름에 관한 충고와 조언 등이 그런 것이다. 심지어는 친구한테서마저.
올바름에 관한 충고와 조언이 악의에서 비롯된 거라면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가까운 사이인 만큼 올바름에 관한 충고와 조언은 대부분 선의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당신이 옳다’는 그런 선의마저 어떤 개별적 존재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례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에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 지 잘 설명한다. 그 책은 마음을 살피는 현미경이다.
마음을 모르면 사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모르고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은 오직 그 사람이 토해내는 발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피 토하는 발언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이 일에 게을렀다. 대신 어디서 읽은 몇 줄의 문장으로 어설픈 충고나 조언을 하려 했었다.
내 마음마저 늘 가시밭길이면서도 그 상처의 원인을 찾아 공감하고 치유하려는 게 아니라 멋지고 웅장한 올바름으로 그것을 덮으려 했다. 나한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됐다. 상처 위에 바른 올바름은 제대로 된 연고가 아니라 소금일 뿐이다. 상처를 더 키울 뿐이다. 인간의 소통은 올바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서로의 상처를 믿고 보여주는 게 소통이다.
관련기사
- NFT 구매, 전혀 다른 두 길...소비 그리고 투자2021.12.08
- 아나키스트와 경제민주화론자의 불편한 동행2021.12.06
- 이준석式 ‘메타버스 정치’...연극과 현실 사이2021.12.05
- 메타버스 시대 주도할 인간의 세 가지 특질2021.11.24
“나는 정의로운 자들의 세상과 작별하였다. 나는 내 당대의 어떠한 가치도 긍정할 수 없었다.” 김훈이 그의 대표작 ‘칼의 노래’ 서문에 쓴 문장이다. 정혜신의 ‘당신 옳다’는 나에게 다시 이 문장을 소환시켜줬다. 이순신을 쓰면서 정의로운 자들의 세상과 작별을 고한다고 말하는 김훈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겠다. 정권이 바뀌고 다시 정의가 하늘을 찌른다. 그 정의가 폭력이 아니길 빌 뿐이다.
남성성의 한계를 알 만큼 알게 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