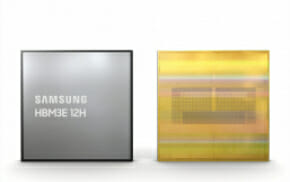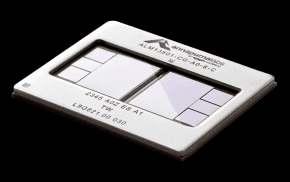최근 메타버스 열풍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도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NFT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고, 카카오는 계열사인 그라운드X를 통해 카카오톡 안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게 출시했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핵심기술인 NFT는 메타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등장은 언제나 기존 법리와 충돌을 야기한다. NFT도 그렇다. NFT는 아직 법적으로 개념조차 정의되지 않았다. 그동안 온라인상 존재하는 이미지나 영상 등은 무한으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원본’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NFT 기술을 적용한다면, 최초 발행자와 콘텐츠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NFT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화로 거래되고 있다.
NFT 거래자에게 부여하는 소위 ‘NFT소유권’은 민법 상 물권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또한 NFT 자체는 데이터에 불과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NFT와 연결된 저작물 보호는 기존 디지털 저작물을 규율하는 저작권 법리로는 충분하지 않다.

2021년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2.0 추진계획’을 보면 당시 NFT의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 했다. 생각건대 3가지 방향이 가능하다.
첫째, NFT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소유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NFT의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다면 관련 분야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법체계 상 NFT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어렵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소유권 체계를 도입하는 가능성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현행 저작권법과 NFT 보유 권리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저작자는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는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 배포권이 1회로 소진한다. 이를 이른바 ‘권리 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이 디지털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NFT는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FT는 발행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가 이뤄지며, NFT와 연결된 디지털 저작물 이용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이용권리는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처럼 NFT 거래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NFT 거래의 안전한 신뢰 보호에 대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NFT 발행이 최초 발행자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으나, 이 발행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NFT를 활용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법적 효과도 불분명하다. NFT거래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시장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고려돼야 한다.
관련기사
- NFT 인증 플랫폼 쿼스, 390만 달러 투자 유치2022.02.16
- 갈라게임즈, 음악 NFT 플랫폼 '갈라 뮤직' 출시2022.02.15
- 금강 김호중 화백 작품, NFT로 판매된다2022.02.15
- 새해 엔비디아 선점할 승자는...삼성·SK 'HBM4' 양산 준비 박차2024.12.22
저작권 인증제도 활용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NFT 운영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자산 영역과 기능을 정의하고 NFT를 자산화, 수익화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려고 디지털 자산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혁명이 우리 코앞에 온 시점에서 NFT에 대한 법, 제도 불확실성과 보안 위협 해소 방안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