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때 ‘여자 스티브 잡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엘리자베스 홈즈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작년 9월 재판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홈즈는 국내에선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선 엄청난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스탠퍼드대학 재학 중인 19세 때 메디컬 기업 테라노스를 창업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검은색 목 폴라를 즐겨 입어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리기도 했다.
테라노스는 한 때 우버,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보다 더 각광받는 스타트업이었다. 홈즈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의 뒤를 이을 혁신 사업가 대접을 받았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실력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 들었다. 실체도 없는 거짓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엘리자베스 홈즈 사건은 언론에게도 아픈 손가락이다. 그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고, 확대재생한 것이 언론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홈즈 홍보 채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무비판적인 받아쓰기를 했던 언론들에게도 아픈 상처가 남을 것 같다.

■ 언론들, '홈즈는 제2의 스티브 잡스'라면서 경쟁적으로 극찬
2003년 테라노스를 창업한 홈즈는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혈액 몇 방울만으로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의료계를 뒤흔들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 못지 않은 혁신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테라노스는 이런 미끼를 앞세워 엄청난 자금을 끌어 모았다. 투자금만 9억4천500만달러(약 1조1270억원)에 달했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같은 내로라 하는 큰 손들이 흔쾌히 투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유력 언론들도 ‘홈즈 띄우기’에 가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3년 9월 7일 주말판 기사를 통해 “엘리자베스 홈즈는 제2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될 자질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의 입을 빌긴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나 다름 없었다.

와이어드, 포천, 포브스 같은 내로라하는 잡지들도 ‘홈즈 신격화’에 경쟁적으로 가세했다.
덕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소개 기사가 실린 지 6개월 뒤인 2014년 2월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9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무렵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35억 달러, 음악 스트리밍 시장 대표주자 스포티파이가 40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고 있었다.
두 회사의 이후 위상을 생각하면 테라노스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홈즈 신화 불지펴…포브스 등 유력잡지 연이어 가세
승승장구하던 홈즈 신화를 무너뜨린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존 캐리루 기자였다. 캐리루 기자는 2015년 10월 1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촉망받는 스타트업의 고군분투(A Prized Statrup’s Struggles)’란 기사를 게재하면서 테라노스가 주장하는 ‘의료 혁명’이 실체가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캐리루 기자는 나중에 ‘배드 블러드: 테라노스의 비밀과 거짓말’이란 저술을 통해 테라노스 탐사보도하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줬다.
엘리자베스 홈즈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배드 블러드’를 다시 떠올리게 됐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홈즈 신화’를 붕괴시킨 캐리루 기자의 탐사보도가 감동적인 만큼이나, 홈즈 신화를 여과 없이 확대 재생산 했던 언론의 무책임한 모습이 무겁게 다가왔다.

홈즈를 스타로 띄운 것은 ‘지라시 성 언론’이 아니었다. 첫 기름을 부은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었다. ‘제2의 스티브 잡스’에 비유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의 2013년 기사는 홈즈의 사기행각 대한 의구심을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포춘, 포브스, 와이어드 같은 저명잡지나 USA 투데이, 폭스, CNN, CBS 같은 유력 매체들도 다르지 않았다. 피 몇 방울로 온갖 질병을 진단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번쯤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어떤 기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언론들 간의 취재 경쟁이 심해질수록 신화의 폭과 깊이만 더해졌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엘리자베스 홈즈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저명잡지 ‘뉴요커’의 간판 IT 기자인 켄 올레타는 테라노스의 혁신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올레타는 ‘구글드: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말’ 등의 저술을 통해 누구보다 깊이 있는 저술 작업을 해 오던 기자였다.
■ 존 캐리루 기자 탐사보도로 거짓말 폭로…흥미진진한 이야기 많아
홈즈의 거짓말 행각이 붕괴되는 과정도 흥미진진하다. 올레타 기자의 기사를 읽은 애덤 클래퍼란 병리학자가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클리퍼는 ‘지나치게 뛰어난’ 기술적 실현이 오히려 수상하다는, 지금보면 지극히 당연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의구심을 개인 블로그에 계속 올렸고, 결국 탐사 전문기자인 존 캐리루에게 제보하게 됐다.
이 과정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사태’와 판박이처럼 닮았다.
제보를 받은 캐리루 기자는 차근 차근 테라노스의 ‘비밀과 거짓말’을 차헤치기 시작했다. 관련자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가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가 하면, 테라노스 장비가 설치된 월그린 매장을 찾아가 직접 혈액 검사를 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실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된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테라노스는 이미 거대한 권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홈즈는 이사진으로 영입한 수 많은 정관계 인사를 통해 기자를 압박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 사주인 루퍼트 머독도 테라노스 투자자였다. 머독은 테라노스에 1억2천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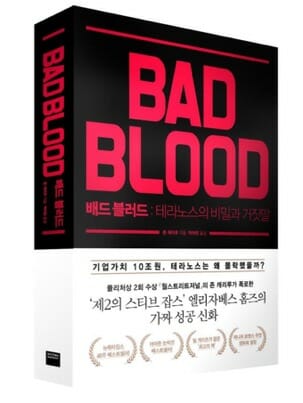
궁지에 몰린 홈즈는 머독을 초대해 캐리루 기자가 거짓 정보를 토대로 테라노스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뼛속까지 ‘사업가’ 기질로 충만했던 머독이자만, 언론 사주로서 본분은 버리지 않았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그들을 신뢰한다”면서 홈즈의 경고를 일축했다. 머독은 투자금은 모두 날렸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잃지 않았다.
존 캐리루 기자는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15년 10월 15일 테라노스의 거짓말과 허점을 폭로하는 첫 기사를 출고했다. 그리곤 연이은 후속 기사를 통해 ‘제2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냈다.
‘배드 블러드’엔 이런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기자가 겪어야 했던 각종 어려움과 시련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캐리루 기자의 자세한 취재 과정이 궁금한 분들은 '배드 블러드’를 한 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 엘리자베스 홈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엘리자베스 홈즈의 ‘테라노스 사기 사건’은 기자나 언론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사건이다. 홈즈를 스타로 키운 것이 ‘비판력을 상실한 언론’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하는 미국의 유력 언론들조차 ‘현란하고 화려한 이야기일수록 한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그래서 테라노스 사건은 미국 언론들에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관련기사
- "여자 잡스→희대의 사기꾼" 엘리자베스 홈즈, 유죄 평결2022.01.04
- 노벨평화상을 받은 어느 여성 언론인 이야기2021.10.13
- 윤석열의 '메이저 언론' 발언이 답답했던 이유2021.09.09
- 추천 대상이던 뉴스, 어쩌다 소음이 됐을까2021.06.18
하지만 홈즈의 가면을 벗긴 것도 언론이었다. 온갖 협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언론의 기본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겐 다소 생소했던 엘리자베스 홈즈란 인물의 사기 사건을 통해 우리 언론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