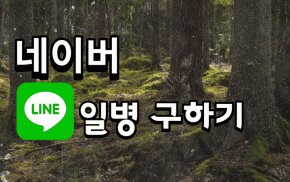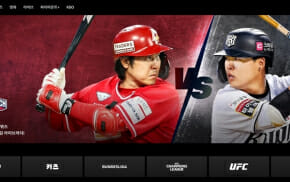‘디지털이다’는 저술로 유명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1990년대말 ‘나만을 위한 신문(The Daily Me)’이란 화두를 던졌다. 미래엔 내 취향에 딱 맞는 뉴스로 구성된 신문이 등장할 것이란 얘기였다.
네그로폰테가 처음 저 화두를 던졌을 땐 ‘상상력 풍부한 학자의 꿈 같은 얘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스마트폰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꿈같은 얘기가 현실이 됐다. 아이패드가 막 인기를 끌 무렵 등장한 플립보드, 자이트(Zite) 같은 앱들은 실제로 ‘나만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줬다.

특히 자이트는 놀라웠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계속 반응을 확인했다. 처음엔 성가셨다. 그런데 ‘이런 뉴스 더 보고 싶다’ ‘이 매체 기사 더 보고 싶다’ 버튼을 눌렀더니, 정말로 내 취향에 딱 들어맞는 뉴스를 추천해주기 시작했다.
이게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혁신적인 앱이란 평가를 받았던 자이트는 그 뒤 이런 저런 사정이 겹치면서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 때 맞춤형 추천이 화두였지만…이젠 맞춤형 제거 시대로
모바일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뉴스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비욘드 뉴스’로 유명한 미첼 스티븐스는 “언론사들에겐 위기일 수 있지만, 뉴스 산업엔 또 다른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상은 늘 바람대로 움직이진 않는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것이 세상의 일반 법칙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뉴스 시장이다. 좋은 뉴스, 내가 관심 가질 만한 뉴스를 추천해줄 것이란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트래픽에 혈안이 된 쓰레기 같은 뉴스, 정파적 이익에 눈이 먼 사실 왜곡 뉴스가 판치고 있다.
최근 들어선 국적 불명의 국제 뉴스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가까운 대만, 중국 뉴스부터 저 멀리 남미,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마구 기사화되고 있다. 독자들의 클릭만 몰아올 수 있다면 신뢰도 낮은 타블로이드에 보도된 기사도 전혀 거리낌 없이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젠 ‘좋은 뉴스 추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보기 싫은 뉴스’ ‘저질 뉴스’를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언론사 밥을 먹고 사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게 된다.

네이버가 ‘보기 싫은 뉴스’를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고 선언했다. ‘추천 뉴스’ 영역에서 보고 싶지 않은 언론사를 직접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선택된 언론사의 기사는 ‘MY뉴스’와 ‘추천 뉴스’ 영역 등에서 숨김 처리된다.
물론 이 기능은 네이버가 처음 도입한 건 아니다. 구글은 몇 년 전부터 ‘구글 뉴스’에 보기 싫은 뉴스 제외하기 기능을 적용했다. 다음 역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게다가 적극적인 구독 기능이 있는 네이버에 보기 싫은 언론사 기사를 가리는 기능이 추가되는 건 자연스러운 균형감각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씁쓸한 마음까지 감추긴 힘들다. 갈수록 뉴스가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 해서다. 네이버가 콘텐츠 제공료를 트래픽 기반으로 바꾸고 난 뒤엔 언론사들이 ‘눈길 끌 기사’를 생산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독자들의 뉴스 피로감은 더 심해진 것 같다.
보다 험난한 날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슬픔 예감
네이버의 이번 조치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과민반응할 사안도 아니다.
‘제외하기’를 선택하는 독자들의 잣대가 단순히 뉴스 품질에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독자들의 확증편향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적극적인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더 슬픈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싫은 뉴스 제외하기’ 시대를 사는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다.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던 ‘맞춤형 추천’의 시대가 끝나고 ‘맞춤형 제거’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다.
실제로 구글이 처음 '보기 싫은 뉴스 제거하기' 기능을 도입했을 때 "한국 포털은 왜 이런 서비스 안하나"라고 지적하는 이용자들도 꽤 있었다. 독자들을 화나게 하는 '소음 가득한 뉴스'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기사
- 네이버뉴스, 보기 싫은 언론사 숨김 기능 제공2021.06.18
- 비트코인 뺨치는 '진기한 뉴스' 채굴전쟁2021.06.15
- '충격'이 없는 미국 언론의 '빌 게이츠 이혼' 보도2021.05.04
- 50대 꼰대 IT 기자의 '알고리즘 뉴스 편집' 유감2021.03.17
그 때문일까? 아니면 날씨 탓일까? 꽤 오래 전 읽었던 어느 소설의 서문을 읆조리게 된다.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리라는 예감이다. 이 밤에 나는 예감을 응시하며 빗소리를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