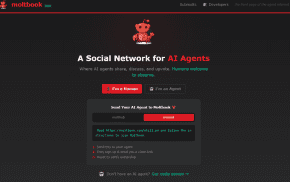PC에 파일을 보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나는 거의 병적으로 그때그때 파일들을 분류해 폴더에 보관하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지 온갖 폴더와 파일들로 가득 차 있는 PC의 바탕화면을 보면 숨이 턱 막힌다. 나름의 기준으로 파일들을 분류해 폴더에 넣은 후 깔끔하게 정리된 바탕화면을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함까지 느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뿌듯함이 짜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PC에 저장돼 있는 파일들이 늘어나면서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폴더로 인해 원하는 파일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폴더 안에 어디 파일들만 있겠는가? 바탕화면처럼 하나의 폴더에 파일이 10개 이상 쌓이면 그 파일들을 또 분류하고, 그 폴더 안에 또 파일이 쌓이면 다시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 방식이 효율적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게 파일들을 분류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실 진실을 믿기보단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상식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의 상식에 반대되지 않게'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설명은 대부분 틀린 설명이다. 사태를 간단히 기술해야 하지만 너무 간단히 기술하면 안 된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에른스트 페터 피셔, '과학을 배반하는 과학' 중에서)

폴더, 디지털로 재현한 아날로그 서랍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억은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차를 사면 가장 유용한 것이 책자로 돼 있는 지도였다.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기 전 자동차 영맨들은 자신에게 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갖은 생색을 내며 지도책을 서비스로 건네줬다. 그리고 낯선 장소를 운전할 땐 으레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지도책을 펼쳐 놓고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연인석이나 배우자석이 아닌 조수석으로 불리게 됐는지도 모른다.
전화번호는 또 어떤가? 내가 외우고 있는 유일한 휴대폰 번호는 옆지기의 번호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지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나마 기억의 쓸모가 남아 있던 시절에 저장된 번호였기 때문이리라. 부모님과 아이들은 나의 뇌가 기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즈음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번호를 외우려면 별도의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를 말해야 할 때나, 급하게 아이의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물은 비밀번호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라고 답할 땐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된다. 그 당황에 동반된 잠시의 멈칫거림으로 인해 졸지에 나는 부모님 휴대폰 번호도 모르는 불효막심한 아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무심한 아빠로 전락하곤 한다.
폴더를 사용해 파일은 분류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저장 방식이다. 누군가 연구를 해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일의 수가 일정량을 넘어가면 폴더는 효율보다 비효율이 커지기 시작한다. 앞의 연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으로부터 대상화된 자연을 분류해 연구하는 사람은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 PC에 있는 파일들을 종-속-과-목-강-문-계-역으로 분류해 폴더해 보관하자고 주장한다면 비웃음만 살 것이 뻔하다. PC의 인터페이스가 그래픽 기반으로 바뀌면서 불리게 된 폴더의 DOS(disk operating system) 시절 이름은 ‘directory’였다. 도스 시절엔 원하는 디렉터리에 들어가기 위해 cd(change directory)라는 명령어 뒤에 디렉터리의 이름을 정확히 타이핑해야 했다. 만약 디렉터리를 기억하지 못할 땐 ‘dir’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PC는 친절하게 디렉터리 이름을 화면에 보여줬다.
나는 1993년 제대 후 처음으로 PC를 접했는데, 당시 프로그래머였던 형에게 도대체 디렉터리가 뭔지 물었던 적이 있다. 형은 자료를 정리하는 서랍같은 거라고 대답해 줬다. PC에서 파일을 분류해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 디렉터리는 사실 아날로그의 저장 방식인 서랍을 디지털로 구현한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엔 개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방 안에 있는 서랍이나 책장, 그리고 별도의 수납장에 저장해 두면 됐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방식을 그대로 PC에 적용했다. 기껏해야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시절에는 디렉터리 방식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양은 기억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구현한 디렉터리나 폴더는 - 저장한 파일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다면 모를까 - 버릴 수도 없고, 쓰자니 불편한 계륵같은 존재가 돼 가고 있다.
그렇다고 도스가 불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PC가 텍스트 기반에서 그래픽 기반으로 넘어갈 즈음 직장에서 한 팀원이 맥에서 작업한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를 윈도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맥의 이미지 확장자는 *.jpeg인데, 윈도에서 인식하게 하려면 *.jpg로 바꿔줘야 한다며 몇백 개가 되는 파일의 확장자를 일일이 바꾸고 있었다. 나는 도스 창을 열어 단 몇 초 만에 그 일을 처리해 주었다. 그때 사용했던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ren *.jpeg *.jpg
해시태그의 등장
파일마다 꼬리표를 달아놓는 해시태그는 빠른 정보의 전달 능력과 함께 강한 휘발성을 갖고 있는 SNS 플랫폼인 '트위터'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본래 해시 기호(#)는 IT 업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978년에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먼저 처리돼야 할 키워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됐다. 당시에는 '해시 기호(hash symbol)'라고 불렸다. 그러다 2007년 트위터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흩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용자 '크리스 메시나(Chris Messena)'가 트위터 측에 "#을 써서 정보를 묶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를 트위터 측이 받아들이면서 해시태그가 시작됐다.
그러나 트위터가 본격적으로 모든 해시태그에 하이퍼링크를 넣은 것은 2009년 7월의 일이다. 트위터는 2010년에 많이 언급된 해시태그를 뽑아 보여주는 '트렌딩 토픽'을 도입하기도 했다. 시작은 트위터였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같은 용도로 해시태그를 지원하고 있다. (위키백과, ‘해시태그’에서 인용)
해시태그가 디지털로 인해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생겨난 이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스티브 잡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란 단지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를 연결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Connect Things)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시태그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인 메타데이터의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는 과거 엄청난 양의 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헌정보학에서 시작한 자료 관리 방식이다. 지금은 한 개인의 PC에 저장돼 있는 정보의 양이 사서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책의 양보다 반드시 적다고 확신할 수 없는 시대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인덱스를 만드는 메타데이타는 디지털 시대에 구글을 비롯한 모든 검색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됐다.
데이터, 분류하지 말고 태그하라!
PC에서 파일을 찾는 것보다 차라리 구글링을 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같은 파일이 여기저기 쌓여 쓸데없이 하드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복된 파일을 골라 없애 주는 웹 서비스나 앱도 등장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파일의 버전을 관리하는 것도 큰일이었다. 회사 PC에서 작업한 파일을 USB에 담아 집에 있는 PC에서 작업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파일이 최종 파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소소한 장점 중 하나는 클라우드를 통해 하나의 파일을 어디서든지 열어보거나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건에 발이 달리지 않은 이상, 서랍 어딘가에 둔 물건은 서랍 어딘가에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파일을 폴더 안에 저장하려면 그 파일을 어느 폴더에 저장해 뒀는지 같이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파일이라고 같은 파일을 여러 폴더에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비효율적이다. 수고스럽더라도 파일을 하나씩 저장할 때마다 관련된 여러 개의 해시태그를 달아둔다면 그 파일이 아무리 깊숙한 폴더에 숨어 있더라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관련기사
-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가 꼭 필요한 이유2021.04.06
- 코로나19가 삼킨 일상...노멀에서 ‘포스트 노멀’로2021.03.23
- 포스트 노멀 시대 똑똑한 길라잡이 'IT'2021.03.09
- ‘디지털 리더십’과 ‘디지털 멤버십’2021.02.23
해시태그는 협업을 할 때 더 큰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정한 기업에서, 특정한 팀이, 특정한 목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는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단순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와 관련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결코 적지 않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파일을 정리해 폴더에 보관한다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의 말을 패러디해 나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소통의 효율성에 관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바보야, 소통의 핵심은 대면, 비대면이 아니라 해시태그야!"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