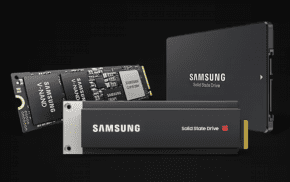구글은 ‘당근’을 꺼내들었다. 페이스북은 ‘채찍’을 휘둘렀다. 두 플랫폼 회사가 호주발 ‘콘텐츠 제공료’ 태풍에 맞서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한 것은 호주가 지난해부터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미디어협상법’이다. 이 법은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뉴스가 사용될 경우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두 회사는 90일 내에 언론사들과 콘텐츠 제공료 협상을 끝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가 임명한 조정관이 관여하게 된다.
조정관이 관여할 경우 호주 언론사 쪽에 더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많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글, 거액 뉴스 사용료 계약…페이스북, 뉴스공유 금지
이런 압박에 맞서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구글은 위협이 될만한 언론사들과 연이어 뉴스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호주 양대 뉴스 그룹인 나인엔터테인먼트, 세븐웨스트미디어그룹과 연이어 저작권료 협상을 성사시켰다. 연 콘텐츠 제공료만 26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다.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 코퍼레이션과도 다년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계약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페이스북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뉴스 콘텐츠 공유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일단 호주 사람들은 뉴스 공유 자체를 하지 못한다. 호주 뿐 아니라 해외 언론사 기사도 공유금지 대상이다.
호주 이외 지역 이용자들은 호주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지 못한다. 공유될 경우 페이스북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왜 다른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일까? 일단 페이스북의 설명을 들어보자.
“구글 검색은 뉴스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게다가 언론사들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반면 언론사들은 페이스북 공유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이를 통해 트래픽과 가입자를 더 늘리며, 광고 수익 증대 효과도 누리고 있다.”
페이스북은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데, 추가로 저작권를 내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의 이런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최근 허위정보 논란이 심해지자 페이스북은 ‘뉴스 노출 억제’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행보는 플랫폼을 바라보는 페이스북의 시선과 관련이 있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뉴스를 유포하는 플랫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는 공간이란 주장이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불만 있는 언론사들은 떠나라”는 엄포도 곧잘 한다.

뉴스 공유를 완전히 막더라도 자신들은 손해볼 것 없다는 자신감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미 언론사들에 혜택을 준만큼 준 상황에서 ‘뉴스 공유 대가’를 주는 선례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구글 역시 호주에서 ‘검색 공유 대가’란 선례를 만드는 건 부담스럽다. 그래서 구글은 우회로를 택했다. ‘뉴스 쇼케이스’란 서비스를 통해 사용료 요구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호주의 거대 미디어그룹들과 체결한 사용료 계약은 전부 ‘뉴스 쇼케이스’ 참여 대가다.
‘뉴스미디어협상법’의 위험을 새로운 서비스 확산의 기회로 바꾸는 전략인 셈이다.
코로나19 허위정보 사태 때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
구글과 페이스북의 이런 행보는 코로나19 허위정보 논란 때와는 조금 다르다. 당시엔 구글 계열인 유튜브는 ‘과잉규제’ 논란을 불사하면서 적극 차단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는 느슨한 규제를 택했다. 트럼프가 선동성 글을 올릴 때도 가능한 삭제 조치를 자제했다.
하지만 호주 뉴스미디어협상법에 대해선 아예 뉴스 공유금지란 극약 처방을 들고 나왔다. “언론사는 자발적으로 페이스북 공유를 택한 뒤 이미 충분한 대가를 누렸다”는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모순된 행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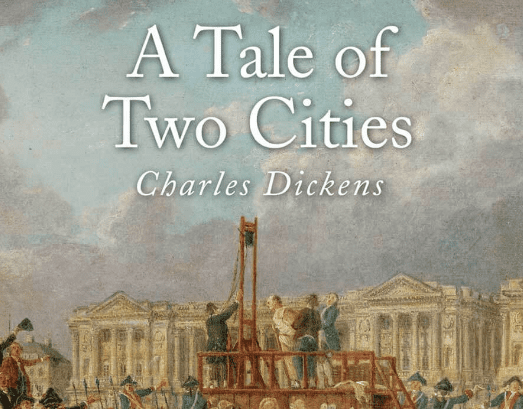
다시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첫 문장을 떠올려본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호주에선 뉴스 공유 못한다"2021.02.18
- 구글, 호주 거대 언론사에 연 257억 저작권료 낸다2021.02.17
- 호주·구글 "뉴스 사용료 내라, 못낸다" 공방2021.02.16
-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두 회사 이야기…구글과 페북의 상반된 플랫폼 전략2020.08.26
과연 페이스북과 구글, 두 회사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 최고일까, 최악일까. 지혜의 산물일까, 어리석음의 산물일까.
거대 플랫폼의 책임성과 중립성이란 또 다른 주제와 맞물려 두 회사의 상반된 정책이 자꾸만 뇌리를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