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 훗날 역사가들은 “2020년엔 전 세계에 역병이 창궐했다”고 쓸 것 같다. 그리곤 “코로나19라 불렸던 그 역병은 그 때까지의 세계질서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평가할 지도 모른다.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정부와 기업, 학교 모두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갈팡질팡했다. ‘언택트’란 정체불명의 단어가 일상 용어가 됐다.
저널리즘 영역도 예외가 될 순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 동안 본능적으로 되풀이했던 수 많은 관행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그 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연말이면 늘 되풀이하는 반성과 성찰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동안의 상식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처절한 자기 부정을 수반하게 된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원인과 의미'에 더 관심 가져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토머스 패터슨(Thomas Patterson)의 ‘Informing the News’를 읽었다. ‘지식 기반 저널리즘의 필요(the need for knowledge-based journalism)’란 부제에 특히 끌렸다.
패터슨은 이 책에서 ‘맹목적 인용보도’에 대해 매섭게 꼬집는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객관보도란 형식에 지나치게 매몰돼 ‘사실 확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맹목적 인용 보도가 진실보다는 '힘/ 권력'이란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는 지적은 아프게 다가왔다.
맹목적 인용보도(he said/she said journalism)가 작동하는 기준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이다. 어떤 의원이 뻔뻔스런 거짓말을 하고, 기자가 "그/그녀가 이렇게 말했다(he said/she said)"는 식의 논쟁거리로 수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경우, 권력자에 대한 맹종 외에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거짓말을 전달하는 순간, 기자는 사기 공모자가 된다. 뉴스에 등장 하는 순간 그 주장은 널리 알려질 뿐 아니라 신뢰까지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언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공중의 알 권리(the public’s right to know)’란 표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꼬집는다. '자기들이 다루고 싶은 주제'를 마구 쏟아내면서 '알 권리'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언론이 쏟아내는 많은 기사들에 대해 공중들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 언론 보도 사례를 통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언론이 톱 기사로 중요하게 취급한 보도와 독자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 기사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이 주로 사용하는 ‘대립과 경쟁 프레임’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어떤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언론들은 주로 양 정파간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누가 이겼는지 분석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쏟아질 때에도, 독자들은 해당 사안이 왜 중요하며, 그게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 언론이 그 문제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자인 패터슨은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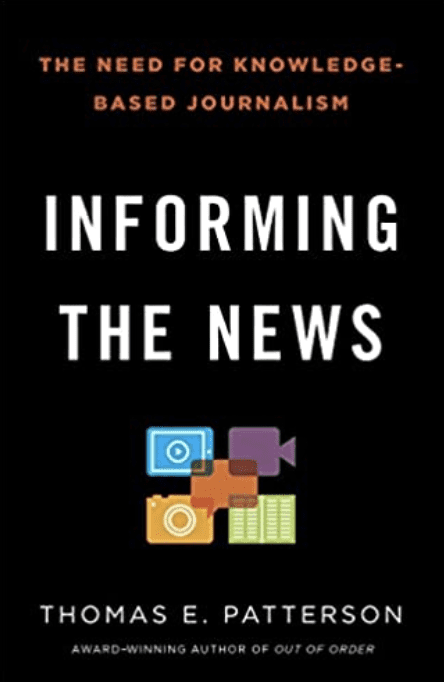
매일 쏟아지는 속보에 몰두하느라 좀 더 큰 맥락을 짚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들이 사건 보도를 할 때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는 비판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저자인 패터슨은 아예 “맥락적 정보 제공이 언론의 장점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패터슨은 미국 언론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통해 이런 진단을 내놓는다. 하지만 한국 언론 역시 이런 비판과 분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미국 언론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언론 보도의 90%는 10%가 생산한 기사의 파생물이다”는 지적 역시 한국 언론의 현 상황과 그리 멀어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뉴노멀 상황, 언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됐으면
인터넷에 이어 소셜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언론도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 동안 언론이 독점했던 정보 전달 기능의 상당 부분이 대중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 학자들이 지혜의 저널리즘(미첼 스티븐스)이나 지식 기반 저널리즘(토머스 패터슨)의 필요하다는 해법을 내놓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늪에서 허덕였던 2020년을 기억 속으로 떠나보내면서 바다 건너 언론 학자들의 충고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언론 역시 ‘언택트 시대’를 맞아 뼈아픈 성찰과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숙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기사
- 인터넷언론 20년 "험난한 행보, 그래도 새 길 만들었다"2020.05.19
-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코로나19 사태' 보도하는 어느 기자의 비망록2020.03.10
-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소설 '페스트'와 코로나19, 그리고 언론의 공포 조장2020.02.27
-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두 회사 이야기2…NYT와 WP의 디지털 혁신2020.12.01
힘든 가운데 올 한해를 잘 이겨낸 많은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내년엔 다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다시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상황’을 한국 언론(과 지디넷)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