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런 멋진 문장으로 시작한다. 작가는 프랑스 혁명 직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배경으로 인간의 희생과 숭고한 사랑의 가치를 잘 보여줬다.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은 그 시기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최고와 최악, 지혜와 어리석음, 믿음과 의심, 빛과 어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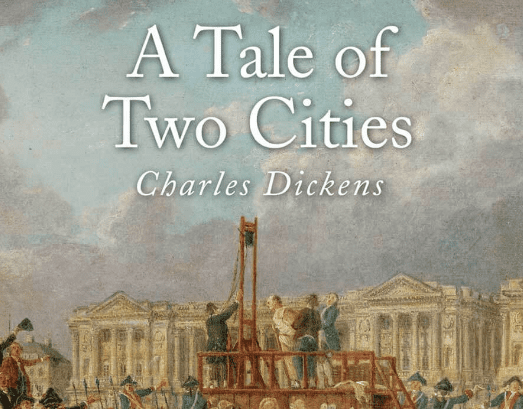
NYT, 스타 기자 영입→브랜드 인지도 확대로 '입소문'
디킨스의 저 문장은 저널리즘에도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다. 지금은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다. 정보의 민주화란 측면에선 최고의 시절이지만,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선 언론사들에게 ‘최악의 시절’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를 주도하는 두 회사가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저널리즘의 찬란한 역사를 주도했던 전통 강자들이다.
저널리즘 강자인 둘은 디지털 영역, 특히 유료 구독자 확보 경쟁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악시오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구독자 600만명, 워싱턴포스트는 300만명을 돌파했다.
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디지털 구독자가 각각 3배 늘었다. ‘트럼프 효과(Trump bump)’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성장세다.

‘디지털 전략’에 속도를 먼저 낸 것은 뉴욕타임스였다. 한 때 한국 언론계에 널리 회자됐던 ‘혁신보고서’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수행했다. 내부 동력이 변화의 힘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달랐다. 한 때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워싱턴포스트는 디지털 혁명의 선두주자인 제프 베조스의 품에 안긴 뒤부터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다. 외부 구원자가 변화를 추동했다.
이런 태생적 차이는 디지털 구독 전략에도 그대로 녹아들었다. 악시오스가 두 회사의 디지털 전략 차이를 잘 요약했다. 그 부분을 살짝 옮겨보자.
뉴욕타임스는 ‘스타 기자’가 주된 무기다. 최근 에즈라 클라인, 벤 스미스, 카라 스위셔 등 스타 기자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 TV쇼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여기에다 요리, 크로스워드 앱 같은 기존 인기 콘텐츠도 독자들의 지갑을 여는 무기다.
악시오스는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구독 전략을 ‘스타 기자를 활용한 브랜드 인지도 확대’로 요약했다.
워싱턴포스트, 스타기자보다 저널리즘…기반기술 투자에도 공들여
워싱턴포스트는 조금 다르다. 스타 기자 영입에는 큰 관심 없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정 주제 영역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름값 있는 개인'보다는 '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 회사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또 있다. 뉴욕타임스 디지털 전략에선 ‘오피니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유료화 초기엔 ‘오피니언’ 쪽에 페이월을 구축하기도 했다. 당시엔 실패했지만, 여전히 오피니언은 뉴욕타임스의 자랑이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오피니언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대신 ‘백엔드 기술’ 투자에 공을 들인다. 이 부분은 제프 베조스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디지털 전략을 대표하는 두 키워드는 ‘제우스’와 ‘아크’다.
제우스는 광고 플랫폼이다. 언론사들과 광고 네트워크를 묶은 리얼타임 비딩 방식의 광고 플랫폼이다. 아크는 워싱턴포스트가 자랑하는 CMS다. 워싱턴포스트는 아크를 자사에서 활용할 뿐 아니라 지역 언론사들들에도 라이선스 판매하고 있다.

제우스와 아크는 워싱턴포스트의 소프트웨어 전략을 대표한다. 그런만큼 중요한 수익원이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들은 워싱턴포스트를 좀 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구독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게 워싱턴포스트는 기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빛나는 ‘전통’과 ‘역사’가 혁신의 동력이다.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외부 기술’이 중요한 힘이다. 워싱턴포스트가 베조스란 구원자가 손을 펼치기 직전까지 몰락의 위기에 내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두 회사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같은 듯 다른 두 회사의 디지털 전략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어느 쪽이 긴 승부에서 승리할까? 악시오스는 이 질문에 직접 답은 피한다. 대신 두 회사의 한계를 짚어주고 있다. 그 부분이 이 질문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엔드 기술’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저널리스트보다는 저널리즘에 무게를 둔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새로운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입소문’을 내는데 있어선 뉴욕타임스보다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
억만장자가 뒤에 있는 워싱턴포스트와 달리 뉴욕타임스는 상장 회사다. 그 때 그 때 실적을 잘 내는 게 중요하다. 투자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구독자 확대’ 압박을 받는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스타 영입’을 통해 입소문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쓰는 사정이 이해된다.
뉴욕타임스는 몇 대째 신문을 경영해온 가문이 이끌고 있다. 그런만큼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보다는 ‘편집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익숙하다.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은 점점 더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물론 워싱턴포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다.)
이런 특징이 워싱턴포스트와의 ‘디지털 천하제일’ 경쟁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덧글]
1.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얘기를 하면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끌어다 쓴 게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다. 괜한 지적 허영 아니냐고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변명삼아 몇 줄 덧붙인다.
2. ’두 도시 이야기’의 파리와 런던은 상반된 도시다. 당시 파리는 피폐한 도시였다. 절대 왕조와 귀족들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다. 반면 런던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정된 도시로 묘사된다. 개인의 자유와 경제 활동이 보장된 곳이었다.
관련기사
- 인터넷언론 20년 "험난한 행보, 그래도 새 길 만들었다"2020.05.19
-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코로나19 사태' 보도하는 어느 기자의 비망록2020.03.10
-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NYT와 버즈피드의 엇갈린 운명…어느 미디어 전문가 이야기2020.01.30
- [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두 회사 이야기…구글과 페북의 상반된 플랫폼 전략2020.08.26
3. 혼란스러웠던 파리가 ‘혁명’의 열기에 들뜬 건 당연한 결과였다. 선택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안정된 도시 런던은 혁명보다는 진화, 발전이 더 자연스러웠다.
4.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행보에서 ‘두 도시 이야기’의 그런 차이가 살짝 엿보이는 것 같다. 물론 ‘혁명의 혼란’ 대신 ‘혁신 DNA’가 엿보이는 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