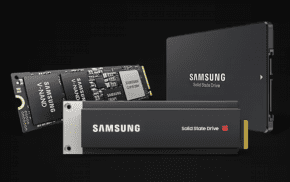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벌인 대국은 ‘세계적인 이벤트’였지만 이 9단에게는 ‘잔인한 게임’이었다. 이 9단은 인간의 절대적인 응원 속에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승부를 펼쳤지만, 이 게임은 자동차와 인간이 달리기 경쟁을 하는 것과 진배없는 일이었다. 많은 인간의 기대와 달리 애초부터 승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는 게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소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알파고는 당시만 해도 베타버전이었다. 미완이었던 셈이다. 그 덕에 이 9단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판이나마 알파고를 이겨본 유일한 인간으로 기록되게 됐다. 문제는 이 9단의 진화 속도와 알파고의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이 9단 또한 계속 진화했을 테지만, 이제 알파고에 2점을 깔아야 하는 접바둑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 9단은 최근 프로기사의 길을 접었다.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알파고다. 이 9단은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더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어 바둑을 관뒀다”고 말했다. “(이제 알파고에게 배워야 하는데) AI에게 바둑을 배우는 게 유쾌한 마음은 아니다”며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지금 과연 그런 것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바둑은 참 묘한 게임이다. 변수가 무궁무진해 이 9단처럼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드높은 창의성이 요구된다. 단순 계산은 상대한테 읽힐 뻔한 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 창의성을 보통은 천재성이라고 말한다. 보통 인간의 계산 테크닉을 뛰어넘는 것이 곧 창의성인 셈이다. 많은 인간이 알파고보다 이 9단을 응원하고 또 이 9단이 이길 것으로 봤던 데는 ‘인간의 창의성’을 높이 사줬기 때문이다.
알파고는 그러나 인간들의 이런 믿음이 오해라는 것을 입증했다. 바둑에 있어서 창의성 혹은 천재성은 계산 능력과 다른 어떤 오묘한 그 무엇이 아니라 단지 ‘계산의 속도’일 뿐이라는 점을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 확인시켜준 것이다. 개념 잡기 모호하기만 한 창의성을 끝없이 미분하면 결국 0이냐 1이냐의 ‘단순 계산’만 남게 되고 그 계속의 속도를 높이는 게 결국 창의성을 올리는 셈이다.
이 9단은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30년 쌓아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다. 예술은 무엇이고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 9단이 느낀 것처럼 그것들도 결국 ‘계산의 속도’라고 정의한다면,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술과 창의성으로 한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기 때문이다. 뭔가가 크게 변한 거다.
예술과 창의마저 ‘계산의 속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9단 뿐 아니라 많은 인간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다. ‘계산의 속도’는 주판과 암산이 중요할 때만 해도 인간의 일이었으나 이제 모든 걸 0과 1로 미분하는 컴퓨터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산의 속도’는 바둑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인간의 일을 미분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이 싸움에서 인간은 결코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혹해지는 이 사실은 노동자(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3주체에 큰 숙제를 던지고 있다. 기업은 이제 국경을 넘어 ‘계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무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의 본질은 인간을 얼마나 빨리 AI로 대체하느냐의 문제다. 기업에는 갈수록 이 대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AI로 인간의 노동을 소외시키는 능력을 가진 인간만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는 ‘혁신’은 따지고 보면 그 이야기다.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이나 예술 그리고 이 모든 걸 위한 인간의 창의성을 AI로 대체하는 것이 곧 혁신이라는 의미가 된다. 기업은 AI 시대에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가계)는 이 9단이 프로기사의 길을 접은 것처럼 심대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노동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AI의 몫이다.
AI 시대엔 다른 새 일자리가 늘어나니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론 새 일자리는 생길 거다. 그러나 기업에게 AI를 통한 혁신이 ‘계산의 속도’를 높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걸 의미하는 한 소외된 노동의 개수를 생성된 노동의 개수로 채울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노동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노동 기반 가계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여기서 생긴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업의 AI 기반 혁신을 고도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가계의 몰락을 막기 위해 그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의 근거지를 확보해야 한다. 서로 다르고 심지어는 배반되는 두 갈래 길 위에서 현묘한 답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아직 어느 정도의 시간은 있지만 서로 모순된 그 두 갈래 길 위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기사
- KT 회장 운명, 사외이사 8명이 가른다2019.11.28
- ‘타다’ 기소 계기로 판결유예 제도 고민해봐야2019.11.28
- 쿠팡 투자 1兆와 네이버-소뱅 1兆의 차이2019.11.28
- AI와 싸우는 노동자와 AI를 부리는 사용자2019.11.28
모두 생각을 바꿔야 한다. 노동 소외로 가계가 몰락하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은 혁신을 고도화하되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몰락하면 당연히 노동도 없다. 노동계는 AI 기반 혁신이 기업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인정하고 노동을 나눔으로써 자리를 확보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노(勞)와 사(社) 모두 모든 걸 가질 순 없다.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일하는 세상’에서 ‘더 적게 일하고 덜 벌되 많이 놀아야 하는 세상’으로 진화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