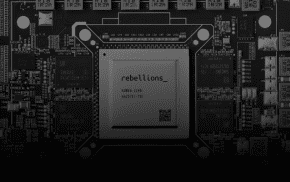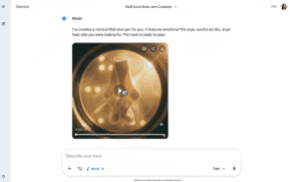방통위가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해 잊혀질 권리연구반이라는 조직을 운영해 왔다. 무려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나 1년 반의 연구기간에 비해 그 결과는 그다지 시원스러운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라느니, '사업체의 경쟁력 저하'라는 등의 반론과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를 법제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시도일까. 필자는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잊혀질 권리를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 혹은 소비자 주권으로 해석하는 행위, 또 반대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보도 출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잘못 됐다는 뜻은 아니다.
법을 살피기 전에 서비스의 구조를 살펴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의 구성을 분석, 연구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잊혀질 권리는 인간의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대립 선상에서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에서 그 쟁점을 파악해 내야 한다.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회원수는 곧 자산이다. 회원들의 생성한 콘텐츠도 또한 자산이다. 한 포털사의 경우 약 200펩타 바이트의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조원의 기업가치로 평가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지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밖에 없다.
포털사의 약관에도 사용자의 콘텐츠는 사용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경우에 따라 사업자의 콘텐츠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자신만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블로그와 카페에 콘텐츠를 축적해 왔다. 자신의 콘텐츠가 어디로 퍼 날라지는지, 어떻게 변형되고 재가공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리포팅도 받은 바가 없으면서 말이다.
잊혀질 권리 연구반의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포털사들은 콘텐츠의 유통경로에 대해 사용자들에 리포팅 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적으로 부여돼 있다.(소비자기본법 4조 15조, 19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30조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35조 이하 조항)
KBS, MBC, SBS 등 힘 있는 권리자의 콘텐츠는 누가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는지, 어떻게 유통돼 퍼져 나가는지가 모두 추적관리 된다. 저작권이란 개념으로 본다면 개인의 저작물이나 방송사의 저작물이나 동일한 권리보호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사용자의 자기 콘텐츠 통제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우선 자기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져야만, 이후 타인의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도 갖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든 콘텐츠, 모든 디지털 파일에 소멸시한과 관련한 꼬리표를 붙여서 그것이 어디를 돌아다니 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뜻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소멸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처럼 기한 없이 생성되고 저장되는 방식으로는 '디지털 대재앙'을 예비할 수 없다.
관련기사
-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산 너머 산’2016.03.03
- 정부, ‘잊혀질권리’ 기준 만든다2016.03.03
- "인터넷글 삭제 본인이 정한다"...강원도 ‘타이머' 첫 적용2016.03.03
- '잊혀질 권리' 논의 본격화...강원도가 나선 이유는?2016.03.03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 돌아왔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돼 버렸다.
앞으로는 지우는 것이 경쟁력이고, 잘 잊어 주는 기업이 박수 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