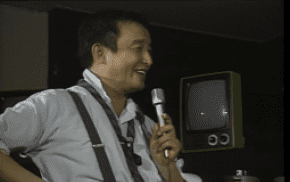깔끔하고 간결한 기사와 기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갈한 차트. 그리고 최소한의 홈페이지만 유지하는 쿼츠는 미국의 대표적인 고품격 경제 사이트 중 하나다.
쿼츠는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 편집국장을 역임한 케빈 덜레이니가 지난 2012년 설립했다. 설립 당시 덜레이니의 목표는 “이코노미스트의 2012년 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최근 출간된 <디지털 뉴스의 혁신>이 소개하는 쿼츠의 성공 전략은 예사롭지 않다. 모바일 기기와 소셜 미디어 공간으로 점점 더 이동해가는 독자들을 잡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써야 할 지에 대한 해답의 단초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잘 아는 것처럼 쿼츠는 출범 초기 홈페이지가 없었다. “콘텐츠 대부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계에 퍼질 것이란 발상에 기반을 둬 설립됐”(75쪽)기 때문이다.

■ "필요한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 게 중요"
당연히 질문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소셜 공간에선 어떤 콘텐츠가 통할까? 쿼츠의 대답은 ‘길이, 깊이, 시의성의 결합’이었다. 이를 위해 그들이 택한 전략이 상당히 흥미롭다.
"(쿼츠 창업자인) 덜레이니는 스토리 길이가 짧고 초점이 명확하거나 (400댠어 미만) 긴 형식(1000단어 이상)이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기자들은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의도는 명확해야 한다. 물론, 짧다고 단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 생략) 500~800단어 사이의 '데스존(death zone)'을 피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유하기에도 길고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에도 길이가 충분치 않다." (76쪽)
작지만 가치 있는 콘텐츠. 그게 바로 쿼츠가 무게를 두는 콘텐츠 전략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바일 공간에선 ‘긴 글’은 절대 읽히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긴 글이라도 읽어내려갈만한 흡입력과 스토리가 있다면 독자들은 기꺼이 시간을 투여한다.
모바일 공간에서 통하지 않는 건 ‘쓸데 없이 긴 글’이다. 짧고 간략하게 써도 될 것을 괜히 길게 늘여놓은 글. 특별한 통찰이나 스토리도 없이, 주변만 계속 건드리는 수다스러운 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바쁜 현대인들은 이런 글들엔 절대 시간을 투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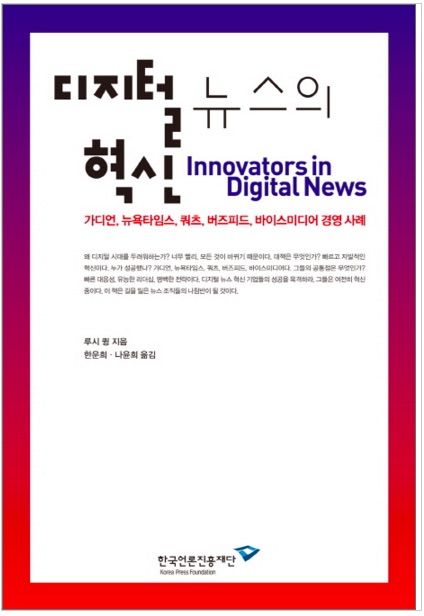
쿼츠는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한다. 역시 <디지털 뉴스의 혁신>에서 그대로 인용해보자.
“우리가 짧게 줄인 다른 부분은 기자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필요한 것 이상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간 생략) 기자들이 기사 초반부에서 목은 그만 가다듬고 요점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 말할 것만 말하고 빠진다. 일부 단어가 차트로 대체 가능하다면 차트를 쓴다. 독자가 흡수하기 좋고 쉬우며 기본적으로 효율이 높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대체한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조중 하나는 독자의 시간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독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지 않는다.” (77쪽)
쿼츠가 ‘차트빌더’란 툴을 만든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숫자나 차트로 말할 수 있는 걸 굳이 글로 너저분하게 길게 늘어놓지 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스토리를 발굴할 때만큼 차트 제작을 위해 데이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옵세션’이란 쿼츠 만의 독특한 콘텐츠 분류 방식이다. 옵세션은 소수 정예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이슈를 다루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옵세션은 영역을 한정짓지 않는다.
저자인 루시 큉은 쿼츠의 옵세션을 “출입처가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의 표지로 삼았고 특정한 주제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쿼츠는 소수의 기자들만으로도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 뉴욕타임스-가디언의 성공 사례도 다뤄
이 책은 쿼츠 외에도 버즈피드, 바이스미디어 같은 신흥 강자들의 혁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들뿐 아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같은 전통 강자들의 디지털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강점은 ‘이론’과 현장의 입체적인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인 루시 큉은 문헌 연구 뿐 아니라 적잖은 인원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를 병행하면서 다섯 개 주요 미디어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이끌어냈는지 분석해준다.
관련기사
- 로봇 기사가 '사람 기자'에게 던지는 경고 메시지2016.01.23
- 디지털 저널리즘계의 '제다이'가 돌아온다2016.01.23
- 백기 든 페북 창업자…'뉴스룸'의 처참한 실패2016.01.23
- '카카오 억대 연봉' 해프닝과 전자 슈터2016.01.23
‘푸시 미디어’ 시대에 맞게 독자들도 이 책을 꼭 저자가 배치한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다. 관심 있는 언론사 중심으로, 관심 가는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 그게 바쁜 시간을 아끼는 또 다른 독서 방법이 될 터이니 말이다.
(루시 큉 지음/ 한운희-나윤희 옮김, 한국언론진흥재단 1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