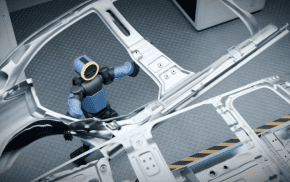1990년대 말 한 잡지에서 읽었던 움베르토 에코 얘기를 잊을 수 없다.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던 당시 논문을 쓰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던 에코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튀어나온 때문이다.
무차별적으로 검색된 1만 건 가까운 자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국 에코는 인터넷 자료 활용을 포기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움베르토 에코는 일반인들에겐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원래 뛰어난 기호학자이자, 재기 넘치는 칼럼니스트이다.)
최근 페이스북이 구글 트래픽을 앞질렀다는 자료를 접하면서 잊고 있던 움베르토 에코 얘기가 생각났다.
일단 팩트부터 한번 살펴보자. 파슬리(Parse.ly)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통해 뉴스 사이트로 유입되는 비중이 43%로 구글 검색(38%)을 앞질렀다. 파슬리는 뉴스 사이트 트래픽 분석 전문업체이다.

■ 뉴스의 원형은 원래 '대화와 토론'
언뜻 보기엔 별 것 아닌 소식일 수도 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외국 업체 얘기들 아니냐고 눙 칠 수도 있다. 하지만 곰곰 따져보면 뉴스 소비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변화다.
미디어오늘 칼럼이 잘 지적한 대로 “우리가 뉴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뉴스의 진짜 가치는 ‘소통의 도구’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 역시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었다. (☞ 미디어오늘 칼럼 바로 가기)
하지만 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변화를 바라보려 한다. 바로 ‘오래된 미래’란 화두다.
‘오래된 미래’는 헬레나 호지가 동명의 책에서 제기한 화두다. 인도 라다크 마을 사례를 집중 조명한 이 책은 전통 문화를 복원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미래로 끌고 가자는 화두를 던진다.
구글에서 페이스북으로 권력의 추가 조금씩 기울고 있는 것과 ‘오래된 미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뉴스의 본질적 속성으로의 회귀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은 당혹스러울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잠시 언론학 고전들을 한번 뒤적여보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에는 근대 뉴스가 등장하던 초기 모습이 잘 나와 있다. 잘 아는 것처럼 근대적인 뉴스의 효시는 18세기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유행했던 카페와 살롱이다.

그 시기 수 많은 사람들은 카페와 살롱에 모여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다. <적과 흑>의 저자였던 평민 스탕달 역시 살롱을 중심으로 유명 인사로 떠올랐다고 한다.
<공론장의 구조변동>에 따르면 당시 살롱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으며, 어떤 주제도 제한 없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한 마디로 금기 없는 공론이 가능했다.
당시 살롱의 주된 토론 대상은 뉴스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주제나 마구 다루었을까? 그건 아니었다고 한다. 살롱 문화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각 살롱별로 전문 분야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A살롱은 철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B살롱은 스포츠에 정통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란 식의 평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는 미셸 스티븐스가 <뉴스의 역사>에서 잘 그려냈다.
"당시 런던은, 오늘날 수많은 잡지들이 쏟아져나와 잡지 홍수 시대를 이룬 것처럼, 수많은 커피하우스로 포화 상태를 이루었다. 그래서 커피하우스는 작은 규모의 특정 손님을 찾아야했는데, 그 때문에 증권에 관심 있는 손님이 모이는 커피하우스는 증권 거래소,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커피하우스는 테니스 코트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뉴욕 커피하우스는 식민지 국가와의 무역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었다. 그리스 커피하우스는 학자들이 많이 출입했다. 연극인 커피하우스와 문학인 커피하우스도 있었다." ('뉴스의 역사' 51쪽)
하버마스는 18세기 살롱에서 공론의 원형을 발견했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근대 뉴스의 탄생이란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함께 소통하고 토론했던 뉴스의 ‘오래된 미래’였기 때문이다.
■ 이젠 생산보다 유통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 생성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나눌 때 즐거움이 더해진다. 생각 다른 사람들과 목청 높여 싸우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그게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인간의 본능 속에 잠재돼 있던 뉴스 본능이다. 이런 속성은 근대 뉴스 서비스 등장 초기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전통 매체의 뉴스 유포 방식과 다르잖아?”란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렇다. 분명 다르다. 우리는 그 동안 대중 매체가 일방적으로 취사선택한 뉴스를 소비하는 데 너무도 익숙했다.
하지만 ‘오래된 미래’란 관점에선 오히려 대중 매체 시대를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산업시대엔 사회가 분화되고, 도달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뉴스의 본질적 속성을 구현할 기술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기술적 한계로 뉴스의 ‘오래된 미래’가 구현되지 못했단 것이다. 그게 대중 매체 시대의 기술적 한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대중 매체가 주도했던 시대는 오히려 뉴스의 역사에서 이단적인 시기로 볼 수도 있다. 하버마스 역시 <공론장의 구조 변화>에서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공론장이 재봉건화되면서 사회적 개인들이 비판적 청중 역할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한 것이 인터넷과 블로그,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SNS다. 이들은 함께 소통하고, 더불어 나누는 뉴스 소비, 즉 뉴스의 '오래된 미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내가 구글에서 페이스북으로 뉴스의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흥분한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젠 뉴스도 ‘검색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한 단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한 마디로 정리해보자. 전통 매체 독자들에게 뉴스는 ‘검색의 대상’이었다. 뉴스를 찾아가야만 했다. 아예 전통 매체들이 내가 ‘찾아야 할’ 뉴스를 패키지로 만들어서 줬다.
하지만 SNS와 모바일이 주된 플랫폼이 되면서 뉴스는 ‘소통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가치를 덧붙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오래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美 대통령, 구글이 밀면 된다?…뜨거운 공방2015.08.26
- '카드뉴스'와 모바일 스토리텔링2015.08.26
- '모바일 퍼스트' NYT "혁신적 모바일 광고 준비"2015.08.26
- 페북 이용자 44% "모바일 기기로만 접속"2015.08.26
이런 변화는 뉴스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많은 고민 거리를 안겨준다. ‘소통의 시대’에 여전히 ‘검색 시대 문법’을 고수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젠 단순한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민은 깊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스프레더블 뉴스(spreadable news)’를 추구해야 한다는 뻔한 얘기 외에는 선뜻 해답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뉴스가 ‘검색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현실 인식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 지점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