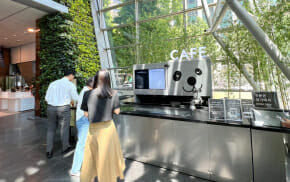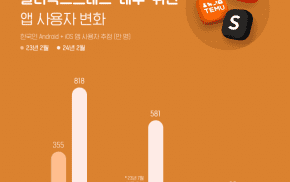데이터 요금제 출시 이후, 일각에서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8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데이터 통신을 통한 정보 접근은 오늘날 사회생활의 필수품이 된 만큼 국가가 최소량의 데이터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품질의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유료 데이터 망과 함께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 대표는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권 보장에 따른 원가를 통신사가 부담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데이터 사용권 보장에 따른 원가를 검증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데이터 요금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4G LTE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3.36GB를 돌파했고 4GB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이통사의 데이터 요금제에는) 4GB와 5GB에 해당하는 요금제는 빠져있고, 한참 건너뛴 뒤 6GB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5만원 이상을 지불하게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에 대해, 실제 이용자 패턴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통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설계하면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의 음성통화와 데이터 이용 패턴을 분석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샘플링을 통해 요금제 구간을 설정했다.
류제명 과장은 “평균 3.2GB의 데이터 이용량이 나오는 것은 10GB 이상 이용하는 헤비 유저의 영향이 크고, 이를 제외하면 정규 분포는 2GB대에서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의 개별 이용 패턴에 따라 다양한 요금 선택권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요금제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요금제를 바꿔도 요금 절감 사례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금 인하 효과가 생겼다는 점은 강조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신규 요금제로 변경한 가입자 비중은 전체 가운데 61%로, 요금 인하 효과가 8천330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150만 01x 가입자, 데이터 요금제 ‘그림의 떡’2015.06.08
- 5만원대 음성-데이터 무제한 시대...무한경쟁 어디까지?2015.06.08
- 데이터 전쟁...이통3사 '엎치락 뒤치락'2015.06.08
- '휴대폰 족쇄' 약정기간 점차 사라진다2015.06.08
아울러 이날 제기된 데이터 공공성에 대해서는 “요금 구간에 따른 데이터 수요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양희 장관이 부임 초기 디지털 디바이드가 데이터 디바이드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류 과장은 또 “정보 격차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비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며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며, 이 부분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