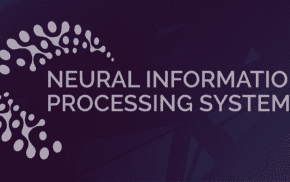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체간 물밑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로밍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장벽 낮추기가 자칫 망 투자가 부실한 통신사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은 망 구축 완료 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사업자의 로밍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 가장 파격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서비스 시작 이후 5년간 전국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5년간 기존 이통사의 망을 빌려쓰는 로밍으로 이용하게 된다. 수도권 밖에서는 제4이통이 구축한 망이 아니라 기존 통신사 망으로 통화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로밍제공사업자 선정 등 관련 법적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고쳐 고시로 못박는다는 계획이다. 또 제4이통이 전국망 구축 이전까지 연도별 망구축 이행 계획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조치에도 수조 단위의 비용이 투자되는 망투자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로밍에 기대 망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알뜰폰(MVNO) 시장만 잡아먹을 뿐 경쟁촉진이란 정책 효과를 이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KMI가 전국 단일망 구축에 쓴 네트워크 비용 추정치는 7년간 약 5조8천억원이다. 전국망 구축을 위해 연간 3조1천375억원, 운영에만 3천885억원이 소요된 셈이다.
실제 지난 2012년, 현재 이동통신3사가 LTE 전국망을 구축하면서 한 해에만 5조2천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즉 장비 구축 비용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수조원의 자본을 갖추지 않은 제4이통이 출범할 경우 반쪽짜리 통신사가 될 수도 있다.

당 정책위는 “로밍 범위가 제4이통 커버리지 내 음영지역까지 확대될 경우 망 투자가 크게 감소해 MVNO와 유사한 사업자가 될 우려도 있다”며 “제4이통 입장에서는 로밍으로 기존 사업자의 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망을 구축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밍을 제공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 또한 망 투자를 경쟁사의 망 품질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체 망을 투자할 이유가 저하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4이통의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필요하지만, 신규 사업자가 이같은 정책적 배려에 크게 의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신규 사업자를 위한 경쟁 보호가 아니라 특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책위의 우려 사항이다.
관련기사
- "제4 이동통신이 어려운 4가지 이유"2015.06.07
- 우리텔레콤 제4이통 출사표...자본금 1조2천억2015.06.07
- 제4 이통 "모든 카드 다 썼다”…누가 들어올까?2015.06.07
- [일지]제4 이동통신사 도전기2015.06.07
업계 관계자는 “로밍 제공 의무화 조항이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일 수 있지만 로밍 대가를 비롯해 제4이통의 망 투자 이행이 부족하면 역으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단을 내릴 준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사업자 선정과 관련 KMI(한국모바일인터넷), 우리텔레콤,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케이컨소시엄, 퀀텀모바일 등 5곳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