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때 필경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적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지만, 그 땐 제법 진지했다. 계기는 간단했다. 다니던 중학교에 근무하던 필경사 아저씨의 글씨가 너무도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 뒤 얘기는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한 때 꽤 중요했던 필경사란 직업은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 인쇄기 대중화란 칼바람을 견뎌내지 못한 탓이다.
일찍이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평평하다’란 책을 통해 “자신의 일을 아웃소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평한 세계에서 한 사람의 경제적 자유는 다른 이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앞에서 예로 든 필경사는 ‘아웃소싱 가능한 직업’이었던 셈이다.

요즘 IT 저널리즘 쪽에선 특히 외신 기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의 주 활동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바뀐 점도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러다보니 너나할 것 없이 특히 아침이면 외신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주된 뉴스 플랫폼인 포털의 IT 섹션에도 외신 기사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자도 늘어난다. IT 전문 매체나 경제지, 종합지 뿐 아니라 연예, 스포츠 매체들까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관련 뉴스들을 쏟아낸다. 일반적인 보도 영역에선 그들이 쓴 기사도 IT 전문 매체 기사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많다.
그 때문이다. 내가 느닷없이 어릴 적 필경사 아저씨와 프리드먼의 ‘세계는 평평하다’는 책을 동시에 떠올린 것은. 요즘 IT 외신 기사를 보면서 ’아웃소싱 가능한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다.
한 때 ‘영어실력자=외신 기자’란 등식이 성립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나친 단순화를 무릅쓰고 얘기하자면, 영어가 대중화되기 전 얘기다. 하지만 요즘 들어오는 기자들은 영어를 읽고 독해하는 걸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조금만 훈련하면 외신 기사는 얼추 흉내낼 수 있다.
난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빅데이터다. 여기서 웬 빅데이터? 란 질문이 날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얘길 한번 해보자.
■ '단순 보도' 영역에선 이미 평평해진 일본 외신
한국 야구 스타들이 일본에 진출하면서 스포츠 기자들 사이에선 일본발 기사가 갑자기 중요해졌다. 그런데 일본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자들도 일본 신문 기사를 곧잘 썼다. 번역기를 이용하면 웬만큼 해독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정교한 기사가 아닌 다음에야 일본어를 해독해서 기사 쓰는 덴 어학 능력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란 의미다. 그보다는 배경 지식과 맥락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난 빅데이터 시대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영어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무슨 얘기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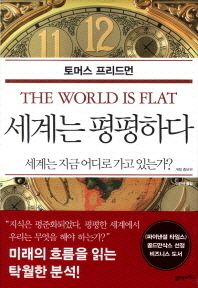
영한번역이 일한번역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따져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흔히 한국어가 영어보다는 일본어와 더 유사하기 때문에 번역도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이 하는 번역은 그 얘기가 맞다. 하지만 구글 번역기 같은 기계적 번역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구글 번역기를 개발할 때 기본 자료가 됐던 게 유럽연합(EU)의 각종 문건이라고 들었다. EU는 공식 문건을 하나 만들 때마다 각나라 언어로 번역해야만 한다. 당연히 번역에도 엄청난 공을 들인 문건들이다.
구글은 바로 이 문건을 이용해 번역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한다. 따라서 영어를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번역할 때 정확도가 뛰어난 것은 어순 때문이 아니다. 빅데이터 분석 덕분이다.
반면 영한 번역은 자료로 삼을 데이터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번역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뻔한 얘기지만, 컴퓨터는 데이터가 있는 만큼만 분석할 수 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난 요즘 IT 저널리즘 현장을 보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다. IT 외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IT 기사들이 아웃소싱 가능한 영역으로 편입될 수도 있겠단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IT 전문지 종사자 입장에선 외신 기사가 특히 신경 쓰인다. 대한민국 웬만한 기자들은 영어 실력이 웬만큼 될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상식도 웬만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압도할만한 통찰력과 맥락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엔 설 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멀 스멀 고개를 든다.
관련기사
- 저널리즘 위협하는 '파괴적 혁신'의 힘2014.10.30
- 빅데이터 암호화, 한국서 통할까2014.10.30
-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결합 급물살2014.10.30
- '패배자' 넷스케이프를 위한 변명2014.10.30
다시 프리드먼 얘기로 돌아가보자. 프리드먼은 장벽이 많은 세계에서는 평범해도 웬만큼 대접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평평한 세계에서는 절대로 평범해선 안 된다고 갈파했다. 이 말에 100% 공감한다.
난 빅데이터 분석이 지금보다 좀 더 정교해지면 수 많은 영역이 평평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IT 저널리즘, 특히 외신 보도 영역도 그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그래야만 ‘아웃소싱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