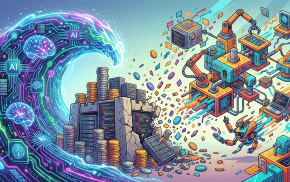모바일 게임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덩치에 비해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라인업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안착했지만 정작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모바일 게임에 주력했던 회사들이 다시 온라인 게임 시장에 눈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급변한 게임 시장 환경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안착한 국내 주요 게임사는 CJ E&M 넷마블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다. 두 회사는 각각 ‘몬스터길들이기’, ‘윈드러너’ 등을 시장에 내놓으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넷마블의 경우 ‘모두의마블’, ‘마구마구2014’, ‘다함께던전왕’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온라인 게임의 부진을 떨치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넷마블의 지난해 매출은 4천968억원으로 전년보다 134% 성장했으며, 위메이드 역시 같은 기간 2천27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이전보다 90%나 상승했다.
작년 8월 공식 출범한 NHN엔터테인먼트 역시 ‘포코팡’, ‘쯔리토모’ 등 모바일 게임과 ‘에오스’, ‘풋볼데이’ 등 온라인 게임의 성공으로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8% 증가했다.
하지만 이 게임사들의 공통점은 올라간 매출만큼 영업이익이 따라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넷마블의 작년 영업이익은 667억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이 13.42%로 낮게 집계됐다. 위메이드 역시 영업이익 123억4천200만원을 남겨 영업이익률 5.43%를 기록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4분기 영업이익이 268억원으로 집계돼 영업이익률이 16.36%에 그쳤다.

이 같은 영업이익률 감소의 원인은 모바일 게임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재주는 게임사들이 부리는데 돈은 플랫폼 및 마케팅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시장 구조가 된 탓이 크다. 한 마케팅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만 7배 가까이 뛰는 등 게임 시장에서 들어온 마케팅 비용으로 회사가 큰 성장을 거두기도 했다.
여기에 기존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온라인 게임들의 매출이 시장 변화로 줄면서 게임사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도 있다.
온라인 게임이 시장 주류였던 당시 최소 20%에서 많게는 30~40% 영업이익률을 거두던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매출은 높였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다.
정통 모바일 게임사인 게임빌과 컴투스의 경우도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각각 14.9%, 9.5%에 그쳐 “열심히 일하고 남의 배만 불렸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들었다.

이에 최근 국내 게임 시장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 안착했다고 판단한 온라인 게임사들이 다시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결국 답은 온라인 게임이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모바일 게임 시장의 포화도 이 같은 인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넷마블은 전략 액션 게임 ‘파이럿츠’와 2D 횡스크롤 액션 MORPG ‘미스틱파이터’로 온라인 게임 시장에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위메이드 역시 10년 이상 개발한 대작 MMORPG ‘이카루스’로 국내를 넘어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보고 있다.
관련기사
- 넥슨, ‘영웅의군단’ 첫 업데이트 실시2014.03.07
- 다음, '삼국야망S' 구글 마켓 출시2014.03.07
- 모바일 게임, ‘짝퉁’ 지고 ‘웰메이드’ 뜬다2014.03.07
- 이메진, 모바일 MMORPG ‘신마록’ 출시2014.03.07
게임빌과 컴투스 역시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타사 플랫폼을 적적히 활용하면서도, 협업을 통한 자체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강화로 하락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으로 매출 상승에 성공한 게임사들이 이제는 낮아진 영업이익률을 고민하고 있다”며 “과도한 마케팅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수명이 긴 온라인 게임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