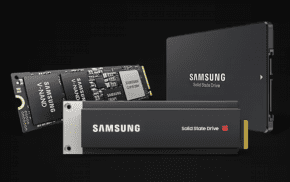공정위가 채찍 대신 빨간펜을 들었다. 문제 삼았던 포털들의 검색 광고를 포털들이 알아서 풀도록 길을 열었다. 일종의 '반성문' 정책을 도입한 셈이다.
포털들도 화답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을 석달안에 내놓기로 했다. 잘못한 점은 이미 일부 시정해 실행중이다. 검색 결과에서 광고를 좀 더 분명하게 표시했다. 부족한 부분은 광고주와 일반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 대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이른바 해결책을 스스로 찾으라는 동의의결제를 업계는 공정위의 한 수로 본다. 칼을 칼집에 넣어둔 채, 포털들이 먼저 시정안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번 결정으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었다는 평가도 한다. 동의의결이란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써먹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는 덤도 얻었다.
만약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선택했다면 역풍도 우려됐다. 구글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그간 정부의 제재 조치에서 제외돼 왔다. 토종 서비스들에 집중된 규제는 우리 정부가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만 깎아먹는다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검색은 제조업이 아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권장 소비자가가 매겨지지만, 검색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긴 어렵다. 공정위가 과징금의 액수를 어느 규모로 산정하든 잡음은 피할 수 없다
공정위가 제재 명령을 내렸다 해도 포털이 불복했을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게 되면 공정위가 이길 수 있을까. 검색 서비스 분야서 해외 경쟁당국들이 유사한 내용에서 자진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판례가 많다. IT에 해박한 법조계 인사들은 공정위의 승률을 낮게 본다.
규제의 칼은 무겁다. 약보다 독이될 때가 많다. 커뮤니티나 중소 사이트 운영자들도 정부가 포털을 규제할 것이라 아니라 제대로 상생하는지 감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번 만들어 놓은 규제안은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목을 겨누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포털 "공정위 자율규제 논의, 환영"2013.11.28
- 공정위 "포털, 과징금 대신 자율규제로"2013.11.28
- 포털 규제, 공정위 오늘 결정에 달렸다2013.11.28
- 공정위 "검색광고, 제재앞서 논의 시작"2013.11.28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 감시다. 지난 200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MS의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며 조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MS가 2011년부터 2년간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 자율안을 우선으로 하되, 감시 역할을 늦추지 않은 사례다.
공은 포털로 넘어왔다. 포털은 더 낮은 자세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안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안은 내놓아야 한다. 포털의 자정 능력이 인정받아야,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털 규제안,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 중독법안 등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