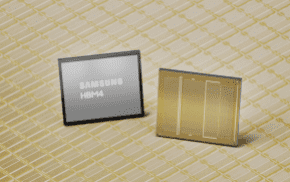“이건 그냥 표시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내는 돈이 아니니 무시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보조금이 바뀌는데, 일일이 어떻게 표시합니까.”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 1주년을 맞았으나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명무실이다. 지키는 곳이 제대로 없을뿐더러 별다른 단속도 없다. ‘공짜폰’이라는 문구 역시 여전히 거리 곳곳에서 흔하게 넘쳐난다.
지난 17~18일 서울 신촌, 홍대 일대와 지난 19일 부산 서면, 수영로터리 일대의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10여곳을 돌아봤지만,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찾기 힘들었다. 그나마 가격을 표시한 곳도 단속을 대비한 출고가만을 표기했을 뿐, 실제 판매 가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단속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가격표시제에 대한 단속도, 관련 지침을 전달 받은 지도 오래됐다는 반응이다.

홍대 근처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 보조금 단속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지, 가격표시제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며 “가격표시제 단속을 한 것도 6개월은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판매점 관계자 역시 “휴대폰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거 다 표시하려면 하루 종일 가격표만 만들고 있어야 된다”며 “오히려 보조금을 많이 주면 소비자는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어 이익 아니냐”고 되물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지난해 1월 지식경제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제도다. 휴대폰의 실제 판매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 고지함으로써 요금 할인액을 더해 마치 공짜인 듯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제도 정착은 요원하다. 보조금 투입으로 인해 휴대폰 판매 가격이 크게 널뛰는 데다, 솜방망이 단속으로 관심까지 멀어졌다. 위반이 적발됐을 경우에 받는 과태료도 1천만원에 불과해 위험부담이 덜하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지경부가 주관하는 합동조사를 통해 점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태를 수시로 조사한다. 그러나 합동조사는 1년에 두세 번 수준으로 제대로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힘든데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상시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
지경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실시한 합동조사는 지난해 8월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7월 중 가격표시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경부가 충분한 인력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기사
- “나는 공짜폰, 벌금쯤이야”…맘 편한 통신사2013.01.24
- 갤S3 공짜폰에 유통 대란…“전산 마비”2013.01.24
- “경쟁사 지르는데”…LTE 공짜폰 ‘봇물’2013.01.24
- 공짜폰 눈속임 여전…벌금 천만원 우습다?2013.01.24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점검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따져볼 계획”이라며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이란 것은 자신이 파는 데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누가 가격을 정해줘서(보조금 변화로) 가격이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효성을 따지기 보다는 다들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