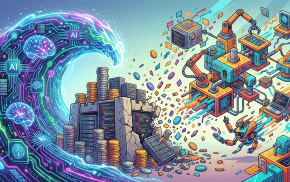한국과 일본, 중국은 닮은 듯 다르다. 위기를 기회로 커나간 이력은 같되, 성장의 속결은 제각각이다. 새 기술 공정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던 일본은 디지털 시대선 맥을 못춘다. 프리미엄 시장으로 안착하며 급성장한 한국 기업 역시 뒤쫓는 중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 엄청난 인구와 자본을 바탕으로 팍스시니카를 꿈꾸지만, 중국 밖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지디넷코리아>는 3회에 걸쳐 달라진 삼국의 IT 기업 판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주]
기술도, 공장도 있는데 팔 곳이 없다. 샤프가 만든 대형 LCD 패널 이야기다. 샤프는 전 세계서 유일하게 10세대 LCD 패널 생산 공장을 가졌지만 경영난에 허덕인다. 60인치 이상 대형 TV 패널을 만들어도 사간다는 곳이 드물다. 공장 가동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전자기기 업체의 몰락은 가파르다.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평판TV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p 빠진 23.8%에 그쳤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를 모두 합친 결과다.
이 기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판TV는 각각 28.5%, 15.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5.8%p, 0.9%p씩 오른 수치다. 소니와 파나소닉이 잃은 점유율(6%)을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가져간 셈이다. 평판TV 시장서 일본 기업을 따돌린 삼성전자의 최근 전략은 '1등'이 아닌 '초격차'다.
르네상스를 노리는 소니와 파나소닉은 올해 독일 IFA서 80인치 이상 UD(4K) TV를 선보였다. 그러나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차세대 패널인 'OLED'로 눈을 돌렸다. 일본 기업 부스를 둘러본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은 이 업체들이 OLED가 없으니 4K, 2K 같은 걸 들고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평가절하했다.

물론 일본은 아직 경제대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GDP)은 한국의 2배고, 인구는 2.5배다. 1억명이 넘는 인구는 일본 내수를 키운 핵심요소다. 핵심 소재 등 부품 경쟁력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럼에도 산업 전문가들은 (TV 시장서) 한국을 이길만한 경쟁자는 단기간 내에 없다고 단언한다. 최근 중국 기업들과 손잡는 일본 기업들의 현실이 절실하다고도 표현했다.
안현승 디스플레이서치코리아 대표는 (일본이 주도하던) 트렌드가 끝났고, 지진이나 원자력 이슈 등으로 자국 시장서 소화하던 소비(물량)가 많이 빠졌다며 디지털 트렌드가 빠르게 바뀔 때 일본기업이 대응이 늦었다. 기술 개발은 일본이 먼저 하면서도 제품화는 한국 기업보다 느리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의 말처럼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이 전성기 시절 구가한 강점을 대부분 잃었다고 평가한다. 첫째는 '시장 대응력'이다. '프리미엄'이란 자존심을 꺾지 못했다. 삼성전자나 비지오가 보급형 TV 바람을 타고 월마트서 점유율을 올리는 사이, 소니는 전자제품 전문점인 베스트바이로 판매처를 한정했다.
소니도 뒤늦게 월마트에 합류, LCD 판가를 낮췄지만 사태 수습엔 늦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40인치 LCD TV 가격이 절반 수준인 1천불(약 11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준비가 안된 소니가 고전하는 순간을 경쟁자들은 놓치지 않았다. 미국 시장내 TV 시장 주도권은 완전히 삼성전자로 넘어갔다.

내수에 천착한 것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마이 웨이'를 외친 샤프는, 세계 시장 흐름과 달리 자체 표준을 고집하며 일본 안에 갇혔다. 고객사들의 입맛에 맞도록 물량과 품질, 납기일을 맞추는데도 서툴렀다. 글로벌 기업들은 샤프를 함께 일하기 가장 까다로운 회사로 꼽는다.
샤프가 타개책으로 삼은 방법은 결국 중국 기업과 협력이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폭스콘 모그룹인 대만 혼하이는 샤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시세에 맞는 지분가를 요구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샤프는 자존심을 구겼다. 이후 일본 언론들은 샤프가 인텔에 300억엔의 자본 출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했다.
혁신의 질이 '원가'에만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기업들은 도요타 생산방식으로 불리는 '저스트인타임(JIT)' 공정을 도입, 부품 재고를 없애 원가 혁신을 일으켰다. 그러나 1990년대 넘어 불어닥친 '창조' 혁신에는 벽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연공서열을 강조하던 보수적 문화가 도전과 창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맥을 못 췄다는 것이다.
김병열 하이얼코리아 지사장은 일본의 경영 방식 자체가 도전과 창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적 문화라며 세계 최강의 위치에서 변화보다는 수성에 치중해 온 부분이 일본의 몰락을 자초하고 한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한 기반이라고 비평했다.
[한중일 IT 기업 현 주소는....]
(상) '수성' 택한 日기업...결국 몰락의 길로
관련기사
- 상반기 반도체…파운드리↑일본↓2012.09.24
- 한국-삼성 조롱하더니…믿었던 日서 폭삭2012.09.24
- 日 메모리 "감산"에도 시황 혼조...왜?2012.09.24
- 日반도체, TSMC에 잇따라 공장 매각2012.09.24
(중) 중국이 쫒아온다? 안갯속 팍스시니카
(하) 韓기업들, 중국 공략이 문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