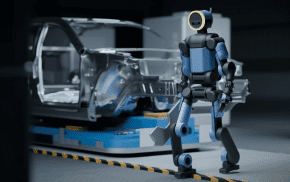3D TV 기술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맞붙었다.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 원색적인 발언이 오가며 연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과거에도 이들은 다양한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노골적이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월 미국 가전박람회 CES2011에서 시작된 비방전이 벌써 석 달이 넘었을 정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쪽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지난해 삼성전자는 전 세계 평판 TV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무려 5년 연속 이어진 기록이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1천억원대의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판가 하락과 늘어만 가는 마케팅 비용 때문이다.LG는 상황이 더욱 안 좋다. 1위와의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지난해 4분기 소니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뼈아픈 시행착오를 경험한 스마트폰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다. 이렇듯 전 세계를 주름잡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TV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양쪽 모두 결코 상황이 좋지 못하다.결국 이들 기업에게는 경쟁을 위한 차별화가 필요했다. TV의 대형화는 이미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결국 남은 것은 3D와 스마트로 압축된다. 스마트TV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그러나 3D TV는 콘텐츠 부족만 극복하면 어느 정도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포문은 LG전자가 먼저 열었다. 독자적인 3D TV 기술인 FPR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같은 기술로 삼성전자와 경쟁하기에는 이미 그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쟁사와 기술 격차를 충분히 벌렸다고 판단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과감한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더니 경쟁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기업에게 자존심이란 결국 '실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실적이 걱정되는데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토록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는 표면적 이유다. 물론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3D TV가 본격적으로 출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3D TV 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2년 전 개봉된 영화 '아바타' 이후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대를 모았던 남아공 월드컵 역시 마찬가지였다.그 사이에 소비자들의 관심은 온통 아이폰이나 갤럭시S와 같은 '스마트폰'에 쏠려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회사의 3D TV를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기는 커녕 구입 여부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그렇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토록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싸운 것이다.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회사 제품이 좋은지 저울질 하도록 했다. 평소 3D TV 구입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은 대단한 발전이다.이후 누가 이기는지 그 결과는 차후의 문제다. 일단 3D TV가 대중의 관심을 받아 팔리기 시작하면 두 회사 모두에게 좋다. 그것이 이들의 진짜 자존심인 '실적'을 지키는 방법이다.
관련기사
- [말말말]3D TV 삼성·LG 치열한 설전2011.03.14
- 삼성vsLG '3D TV' 논란, 종결은 커녕…2011.03.14
- 권영수 LGD "삼성 존경하지만..." 더 무섭다2011.03.14
- 삼성, "LG 기술은 없고 말만..." 맹비난201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