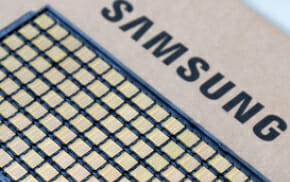미국 신문업계에 몰아친 경영난이 심각하긴 한가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등의 수뇌부가 구글이 자기네 뉴스 덕을 공짜로 보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앞으로는 돈 내고 뉴스를 퍼가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WSJ의 로버트 톰슨 편집장은 오스트레일리안지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기생충”이라며 용감한(?) 발언을 날렸다. 남들이 힘들게 만든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올려 방문자를 모으고, 이에 따른 광고수익은 혼자 챙긴다는 주장이다.
톰슨 편집장은 “독자들 사이서 ‘뉴스 콘텐츠는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다”며 “이 같은 배경에는 구글과 같은 ‘기생충’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AP도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구글을 압박했다.
이같은 신문업계 비판에 구글은 정면 반박한다. 구글이 비판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글의 알렉산더 맥글리브래이 법무 고문은 “우리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콘텐츠 링크를 분명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AP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구글에게 콘텐츠 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전 세계서 구글을 통해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하는 독자 수가 막대한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구글은 경영난에 몰린 신문사들이 일종의 ‘떼 쓰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구글로 인한 방문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고마운 줄 모른다는 해석도 더할 수 있겠다.
이런 가운데 에릭 슈미트 구글 CEO는 신문업계를 달래는(?) 모습도 연출했다. 슈미트 CEO는 7일(현지시간) 미 신문협회 연례행사서 “구글 광고를 통한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료화도 고려할 수 있다”며 “새로운 ‘온라인 저널리즘’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전했다.
관련기사
- 에릭 슈미트 "신문들, 플랫폼으로 변화 필요"2009.04.08
- AP통신, 온라인의 기사 무단사용 법적조치2009.04.08
- 구글에 내준 '내비게이션' 지도, 1대 5000 지도와 뭐가 다를까2026.02.27
- [단독] 주병기 공정위장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도 내려야"2026.02.27
하지만 신문사들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듯하다. 씨넷뉴스 등에 따르면 WSJ와 AP 등은 구글에서 돈을 받아낼 법적 절차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색황제’ 구글과 미 대형 신문사들 간의 전면전이 터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미 신문업계는 사상 최대 위기에 몰렸다. 시카고트리뷴과 로스엔젤레스타임스를 보유한 트리뷴이 지난해 12월 파산보호 신청을 냈고, 선타임스미디어도 이달 초 뒤를 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채무부담으로 인해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