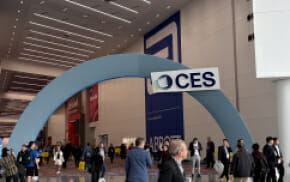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마이스페이스가 한국에서 철수한다.
지난해 5월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지 9개월 만에 나온 소식이다. 당장 이달 18일부터 한국판 마이스페이스는 종적을 감추게 됐다. 마이스페이스 측은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몸집 줄이기 차원 전략이다" 정도로만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 인터넷 병폐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얘기가 들린다. 글로벌 회원 2억명을 거느린 고품격(?) 서비스가 인터넷 국수주의 때문에 퇴출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해외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도 "한국 누리꾼들은 '맹목적'으로 싸이월드만 선호해 미국 서비스가 안먹힌다"며 "인터넷 서비스에서 만큼은 미국산을 은근히 밀어내고 있다"는 푸념을 보탰다.
기자는 이같은 생각에 동의하기 힘들다. 오히려 마이스페이스가 할만큼 했는데도 안됐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국내 시장 공략에 공을 들였는지 묻고 싶다.
마이스페이스의 국내 서비스 수준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많다. 사이트는 단순 한글 번역을 빼면 해외판과 별 차이가 없었고, 마케팅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나마 싸이월드를 본 딴 '미니로그'라는 서비스를 내놓기는 했지만 인기가 미미했고 개선작업도 부족했다. 마이스페이스가 한국 공략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가만히 누워 있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지 않으니 짐을 싸는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마이스페이스의 험난한 국내 행보는 서비스 시작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미국식 서비스를 그대로 옮긴 한국판 마이스페이스로는 싸이월드에 익숙해진 국내 사용자들을 유혹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미국식 웹서비스에 익숙치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쉽게 변하지 않을 한국적 현실이다.
그런만큼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해외 인터넷 업체는 현지화 전략과 나름 적응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명성만 믿고 들어왔다가는 망신당하기 딱 좋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름값을 못하는 해외 유명 웹서비스들은 마이스페이스외에 여럿이다.
때문에 현지화에 대한 눈에 띄는 행보을 보여주지 못한채 한국을 떠나는 마이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국내 인터넷 문화 현실의 희생양이었다는 평가는 '오버액션'이다.
관련기사
- 세계 최대 SNS 마이스페이스, 한국 철수2009.02.09
- 페이스북 일본 공략 ‘어렵네’2009.02.09
- 눈앞으로 다가온 '피지컬 AI'…CES 2026이 증명했다2026.01.11
- [ZD브리핑] 국가대표 AI 1차 탈락팀 발표 예정...새해 행사·정책 일정 잇따라2026.01.11
한국적 현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림돌이 아니다. 이 바닥에 있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비즈니스 조건이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비하는건 기본이다. 마이스페이스가 국내 무대에 적응하는데 있어 9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다.
한국 누리꾼이 마이스페이스를 버렸다기 보다는 충분한 각오없이 들어왔던 마이스페이스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국을 떠난 것이란데 한표 던지고 싶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