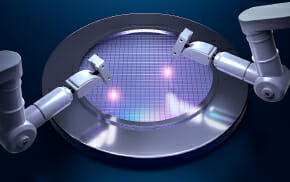지금 필자가 하는 일은 여자를 위한 골프 전문지를 편집하는 것이다. 잡지를 만들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IT 전문지를 만들 때와 비슷한 것이어서 화제로 올리려고 한다. 다름이 아니라 골프계 역시 쓰는 용어의 대부분이 영어로 범벅돼 있다는 사실이다. 파,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가 그렇고, 골프장은 '골프클럽'이라고 한다. 경기가 펼쳐지는 곳 자체는 '그린'이고 공도 '볼'이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처음 이 잡지를 책임졌을 때 이글이나 버디,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는 어쩔 수 없겠지만, 고칠 수 있는 건 고쳐 써보자고 제안했다. '골프장'이나 '골프장갑', '골프화'라고는 하는데 왜 '골프공'이라고 쓰지 못하느냐는 정도.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편집진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어쨌든 안된다!"였다. 이미 골퍼들의 입에 굳어진 말이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촌스럽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바 아니고, 특별히 고쳐 쓸 말도 마땅치 않기에 못마땅하지만 넘어갔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억지다골프도 이런 판국인데, 필자의 전력을 아는 골프 매체 편집진들은 "IT쪽 용어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가끔 묻는다. 골프 쪽은 이글이 뭐고 아이언이 뭔지만 알고 나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사실 IT쪽은 문제가 심각하다. 한 전문지의 뉴스기사를 읽어보자. "싱글 사인온 보안에 대한 B2B 사이트의 수요가 늘면서, 최종 스펙 발표를 앞두고 벤더들이 애플리케이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툴은 프론트엔드와 API를 제공함으로써 IT 매니저들이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원한다." 영어가 많아 답답해서 그렇지 문장이 이해는 된다. 여기서 싱글 사인온을 단일 서명으로, 사이트는 쪽, 스펙은 규격이나 사양, 벤더는 공급업체, 애플리케이션은 응용프로그램이 어떨까. 프론트엔드는 시스템의 앞단이라고 해도 괜찮고 API는 괄호 안에 영어 단어를 풀어 줄 수 있겠다. 매니저는 관리자, 모니터링은 문맥으로 볼 때 관리 또는 감시라고 바꾸어도 틀린 건 아닐 것이다. 고쳐본 문장 속 단어의 뜻을 깊게 따지고 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IT 언론의 편집자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한다. 애플리케이션을 무조건 응용프로그램으로 바꿔 쓸 순 없다, 영어 자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 단어만이 그걸 가장 잘 표현한다, 한글로 고치느니 영어 발음 그대로 쓰는 게 낫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함정에 빠져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기우다. 대부분의 독자는 그렇게 민감하게 따지지 않는다. 내용의 잘잘못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말로 바꿔보고자 한 단어를 가지고 시비를 걸 독자는 많지 않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독자를 버릇들여야 한다. 'e-프로큐어먼트'라는 말이 한창 쓰일 때 'e-조달'로 바꿔 썼더니 많이 따라 했고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다. 쉽게 독자를 이해시키는 일이 급하다. 거부감이 들만큼 콱 막히는 단어와 문장 때문에 몇 장 넘기다말고 기사를 덮어버린다면 손해는 글을 쓴 사람에게 돌아간다. 입말로 굳어지면 평생 못 바꾸기 때문에외래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래 말의 어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relay'를 '릴레이'로 쓸 수 있고 '이어달리기'로 쓸 수 있다. '계주'라는 말도 쓰는데 이어달리기라는 좋은 우리말을 두고 억지로 한문을 갖다 쓸 이유는 없다. 아무리 해도 그것을 대치할 말을 찾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치할 말을 찾아서 써야 한다. 새로운 용어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마다 토박이말(어쩔 수 없이 한자어가 많이 쓰이겠지만)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일단 받아들인 뒤에 바꾸려면 입이 굳어 있어 어렵다.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느니보다 터지지 않게 대비하는 것이다. 신(新) IT 용어들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야 한다.지디넷이나 inews24같은 인터넷 매체나 IT 전문 일간지와 월간지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들은 후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고, 그것을 끈기 있게 '우겨서' 쓰는 것이다. 일간지의 교열기자협회가 그런 일을 하는데 외래어 표기를 다룰 뿐 우리말로 고쳐 쓰는 건 각 언론사에 맡기는 편이다. IT 전문 언론사들이 나서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렇게 바꿔 써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해하는 데 더 편한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하느냐"고 필자는 묻고 싶다. 아니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의미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고 말하거나. 그냥 넘어가도 '대세에 지장이 없을' 국회의원 명패를 한글로 바꾸고, 금배지 속의 혹(或)자 같은 국(國)자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이가 있다면 의미있는 일 아닌가. 한글날을 앞두고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고.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