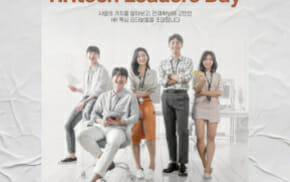한국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대표주자들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회사가 잘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좋지 못해 불거져 나온 경영권 분쟁이다. 이러다가 한국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던 '아래아 한글'이나 '나모 웹에디터'마저 불신을 받아 사용자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필자는 특히 나모인터랙티브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고백컨대, 2000년 가을에 벤처기업 CEO에 관한 기획기사를 쓰면서, 당시의 김흥준-박흥호 공동경영 체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CEO의 전형"이라고 썼다. 그런데 지금 둘이 맞붙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박흥호-김흥준의 관계가, 이젠 서로를 비난하며 경영권을 유지하고 빼앗으려는 사이로 변한 것이다. 돈이나 권력 앞에서는 형제간도 없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서로의 신경을 건들지 마라?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서너 살 나지만 친구처럼 지냈고, 창업을 같이 해 이해의 폭이 넓고 역할을 분명히 나눠 성공한 케이스였다. 당시 필자는 "둘은 각각 마케팅과 기술 개발을 나눠 맡으면서, 해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고 코스닥의 우량주로 자리 잡았다"고 썼다. 정말 그랬다. 그렇다면 2∼3년 전에 보여주었던 둘의 관계는 물밑에 가려진 채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였던 것일까?나모는 엔지니어와 전주(錢主)의 결합이었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엔젤이 엔젤로서 남지 못하고 꼭 경영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어쨌든 설립 초기, 대주주는 회사 틀을 잡고, 공동운영을 하다가 경영권을 CTO에게 넘겼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지자 주주로서 감시 역할만 하기에는 불안했던지 사원의 힘을 빌려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주요 주주로서 당연히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라지만, 현 경영자는 기업공개 때 무책임하게 주식을 팔아 챙긴 대주주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반박한다. 외국계 DBMS업체 지사장을 마치고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체에서 공동CEO를 6개월 정도 했던 K씨에게 물었다. 그는 공동CEO 제도를 "항시 전쟁 상태"라고 표현했다. 업무 영역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오너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었단다. 의도는 훌륭하지만 둘의 비전과 마인드가 틀어지면 둘 중 하나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신경을 쓰는 일이 미칠 지경이었으며,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전했다.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그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다." 맞는 말이다. 가장 안정적인 기업의 조직구조는 최종 책임이 한 곳으로 몰리는 구조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둘의 사이가 더할 나위없이 친밀해도 사장을 나눠 가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한 회사에서 두 명의 사장이 조화로운 경영을 펼친다는 것은 말로만 쉽다. 업무 분담이 명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만 쉽다. 하나의 비전을 갖고 나가는데 어떻게 '너는 나, 나는 너'처럼 살 수 있을까.나모 역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양보하거나 모른 척 넘어간 적도 있을 것이다. 쌓였던 그것이 지금 상황을 불렀다. 공동CEO의 실패는 경영보다는 권력에 더 관심을 가진 CEO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지금 직원들이 파(派)가 갈린 것은 그런 '파워 게임'의 결과물이다. 직원들은 어린애 장난처럼 누가 더 싸움을 잘 하느냐에 관심을 쏟았고, 의도하지 않게 두 경영자는 링 위에 올랐으며 직원들은 관중이 됐다.우리는 이런 상황이 잠재됐다 폭발한 공동CEO 체제의 벤처기업들을 많이 봤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두 명이 움직였을 터인데 왜 지경이 됐을까. '보완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단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보다, 장점을 강조하면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생각이 앞선 탓이다. 아무리 공동이라도 확실한 상하 체계도 없었다. 필자가 15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얻은 알량한 경험은 "경영은 합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친구끼리 동업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직 버티고 있는 것이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