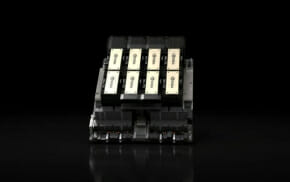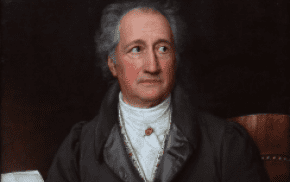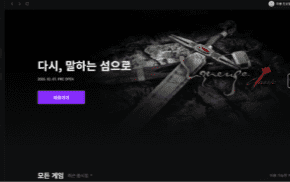‘임신중 당뇨병’ 환자 자녀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률이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대한당뇨병학회의 ‘임신당뇨병 팩트시트 특별판’에 따르면, 국내 임신성 당뇨병 유병률은 지난 2013년 7.6%에서 2023년 12.4%로 증가했다. 이는 산모의 출산연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전체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13년 31.8세에서 2023년 33.5세로 높아졌다. 40세 이상 산모에서는 약 5명 가운데 1명(18.6%)이 임신중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또 임신 전 체질량지수(BMI)와 임신중 당뇨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BMI 30kg/㎡ 이상인 비만의 경우 임신성 당뇨병 유병률은 23.5%로, 정상범위 18.5≤BMI<23kg/㎡ 9.9% 비해 2.37배가 높았다.
임신성 당뇨병은 출산 후 산모와 자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성 당뇨병을 겪은 여성은 정상 혈당 산모보다 향후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6.1배 높았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1.5배 증가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작년부터 전국의 9개 병원과 ‘임신성 당뇨병 코호트’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가계 코호트’로 확대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분당차병원 류현미 교수가 국내 임신부 2천227명을 대상으로 한 임신성 당뇨 코호트 선행연구(KPOS)에 따르면, 임신초기에 영양 섭취가 가장 불균형했던 하위 25% 그룹은 영양 상태가 가장 양호했던 그룹에 비해 임신중 당뇨병 발생 위험이 1.82배 높았다. 비타민 B6와 나이아신(비타민 B3), 칼슘 등 섭취가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면 임신중 당뇨병 위험이 각각 1.62배, 1.54배, 1.39배 증가했다.
또 서울대병원 곽수헌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명의 2009년∼2018년 기간 동안 데이터를 토대로 임신성 당뇨병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성 당뇨병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성장 후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그렇지 않으면 비해 약 1.5배 높았다.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산모는 자녀의 당뇨병 위험이 훨씬 더 커져 2형 당뇨병은 약 4.6배, 1형 당뇨병은 약 2.2배 증가했다. 일반적인 임신성 당뇨병은 자녀의 1형 당뇨병 발생과는 뚜렷한 연관이 없었다. 제왕절개 분만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도 자녀의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최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연세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은 “임신중 당뇨병은 임신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해 출산 후 정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임신 전부터 체계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며 임신성 당뇨병 진단 시 출산 후에도 꾸준한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도 “국가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임신중 당뇨병의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