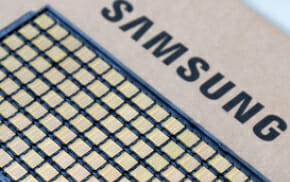안전은 더 이상 추상적인 공공재가 아니다. 범죄, 재난, 사이버 위협이 기술화·지능화하는 오늘날, 안전은 곧 국가의 미래 자산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ICT 인프라와 경찰 역량 또한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강점을 산업적 가치로 전환하는 시도는 체계적이지 않다. 치안의 수요는 본질적으로 공공 영역에 집중돼 있지만, 관련 연구개발(R&D)과 자본 조달 구조는 산발적이고 규모도 작다. 이는 곧 치안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위험의 스펙트럼을 보면, 가장 폭력적이고 고강도의 물리적 리스크는 방위산업이 맡아왔다. 반대로 일상에서의 저강도 리스크는 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로 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간 영역—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 사회적 혼란, 재난 등—은 경찰과 치안 역량이 담당해야 한다.

문제는 이 영역에서조차 기술적 투자가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보이스피싱만 해도 2023년 기준 피해액이 1조 3531억 원(금융감독원 자료)으로 집계됐고, 최근 5년간 누적 피해는 6조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경찰의 관련 R&D 예산은 전체 치안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 비용 대비 투자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해외 사례는 다르다. 미국은 CIA와 국방부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인큐텔(In-Q-Tel)을 통해 매년 5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사이버보안·AI·드론 분야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싱가포르는 내무부 산하 HTX를 통해 국가 치안 기술 R&D에 연간 1억 싱가포르 달러(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 직속의 리버타드 벤처스를 통해 보안·사이버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하며, 확보한 기술을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확산시킨다. 세 나라 모두 정부 예산·전략펀드·법적 지원이라는 삼각축을 통해 치안·안전 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한국은 방위산업의 성공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방위산업법 제정과 방위사업청 설립, 공공 조달 체계 마련은 민간 기업의 성장을 촉진했고, 그 결과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 같은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30년까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안산업도 동일한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공공 수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민간 기술을 육성한다면, 제2의 K-방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스마트 감시·순찰, 데이터 기반 치안 서비스는 이미 글로벌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분야다.
치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산업·고용·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치안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고, 청년 인재뿐 아니라 퇴직 경찰·군인·기술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높아지고, 한국은 K-방산에 이어 K-치안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의 초기 투자와 민간 자본의 후속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게 되면 산업 성장, 고용 창출, 사회 안정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보이스피싱 예방, 구글도 韓정부에 힘 보탠다2025.09.04
- 보이스피싱 실시간 감지...특별단속으로 범죄조직 일망타진2025.08.28
- 구글에 내준 '내비게이션' 지도, 1대 5000 지도와 뭐가 다를까2026.02.27
-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격...중동 전면전 위기에 비트코인 3% 급락2026.02.28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와 자본이다. '치안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전략펀드를 조성해 자본 공급 구조를 갖춰야 한다. 초기에는 모태펀드·성장금융 등 정책 자금을 활용해 마중물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대기업·금융기관·글로벌 투자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치안산업은 방위산업과 보험산업 사이에서 ‘중간 리스크’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산업이다. 이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축이 되었듯, 치안산업도 제2의 K-방산, K-치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