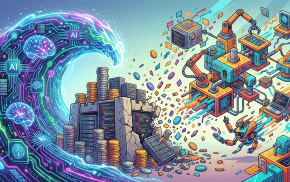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는 다양할 수 있다. 주체가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시간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시간이라는 인식론적 개념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물은 인위적인 시간의 개념을 알 수 없다. 기록되거나 측정되지 않는 자연의 시간은 인간에 의해 분절됨으로써 측정되고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이 시간을 인위적으로 분절한 이유는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였을 듯하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느 순간 자연 생태계가 어떤 리듬을 갖고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했을 듯하다. 관찰하기 좋아하고 사려 깊은 이들에 의해 그 순환의 과정이 포착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을 마디로 분절해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인류 최초의 발명품을 논할 때 대개는 주먹도끼나 토기 등을 언급하는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생산성을 혁명적으로 극대화한 초기의 발명 가운데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연의 시간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흐르는 불가역성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순환하고 분절하는 방식으로 재발견하였다. 불가역성의 시간 속에서도 자연은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 같은 수렵과 채집을 벗어나 한 곳에 정착하면서도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진 데는 주먹도끼나 토기의 발명도 도움이 컸겠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때가 되면 같은 자리에 맛있는 게 다시 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하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순환을 알게 되고 정착을 도모했을 것이다. 그 순환을 해와 달을 통해 파악하기 시작했고 합리적인 시간의 개념도 정립됐을 터이다.
인간의 삶이 오직 자연과의 쟁투이기만 했던 시절 시간은 그렇게 인간에 우호적이기만 했다. 하지만 생산력이 높아지고 인간의 삶이 자연과의 쟁투보다 인간 사이 쟁투로 변해가면서 시간의 본질도 크게 달라졌다. 자연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었던 시간이라는 개념은 점차 인간 사이에서 서로 뺏기거나 뺏어야 할 최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다. 문명화된 인류의 싸움은 한편으론 시간 뺏기 전쟁이다.
노예는 개인의 시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인간이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시간을 인식조차 못하면서 제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 다 쓰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다. 이 파렴치한 제도는 문명화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존재한 제도다. 대개 일찍이 없어졌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 부자인 나라 미국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없앤 건 불과 160년 전이다. 그 뒤로도 상흔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다른 인간의 모든 시간을 강제적으로 약탈하는 것은 파렴치할뿐더러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산적이지도 못해 시간 싸움의 방식은 바뀌게 됐다. 시간을 상품으로 재발명한 것이다. 시간이 상품으로 발명된 이유는 노예처럼 타인의 시간 전체를 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대가를 주고 일부를 점유하는 게 대량 구매와 재생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약탈이 아닌 정당한 상품 거래로 포장할 수 있어서다.
삶은 어쩌면 일정하게 제한된 시간을 쓰는 일이다. 무엇을 위해 제한된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가 삶의 핵심 문제다. 시간을 쓰고 싶은 게 있고, 쓰고 싶지는 않지만 써야만 하는 게 있다. 후자보다 전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상품이 된 사회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많다는 데 있다.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사회에서 대개는 이래저래 시간의 노예로 사는 거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최저임금 시급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논란을 떠나 시간이 상품이 된 사회에서 최저임금제를 만든 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 시간이 상품이고 상품의 가격은 사고파는 이의 합의(혹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다. 하지만 시간이란 상품은 곧 인간의 삶이라는 걸 다시 되새겨보고 싶다.
관련기사
- 정부가 시장에 풀 ‘메기’를 낳을 수 있을까2023.07.13
- 누가 공영방송을 야누스의 괴물로 만들었는가2023.07.06
- 공공 SW사업의 본질과 대기업 참여 제한의 충돌2023.06.30
- 환자가 없다면 어떻게 의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2023.06.28
저울로 돼지고기 근수를 달 듯 삶의 가격을 흥정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발명 수준이 거기에서 그쳐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시간을 점유하거나 공유할 때 그 행위로 그의 삶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사실이 잘 인식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불가역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공유할 때 그가 쓰고 싶었던 시간이 되게 하는 게 곧 사랑이다.
인간의 고통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서로 모르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존재끼리 관계 맺고 사는 데서 나온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한 누구든 언제든 시간 도둑이 될 수 있다. 시간이야 말로 각 개인이 소유한 제한된 고유자산임이 강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