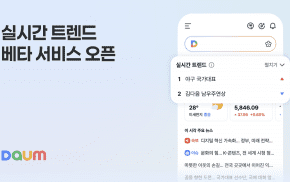아직도 ‘자율주행’과 ‘주행보조(ADAS)’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현재 장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유지보조 기능들을 자율주행 기술의 한 부분으로 오해하고 있다. 또 주행보조 장치를 자율주행 장치로 불법 전환시키기 위한 외부장치(모듈)를 장착한 사례가 나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율주행’과 ‘주행보조’는 차량과 사물 간 원격 통신이 가능한 ‘V2X’ 시스템 기준에 따라 범위와 기준 등이 나뉜다. 여러 돌발 상황등을 V2X 시스템으로 수신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되고, 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자의 주행피로를 덜어주는 개념이라면 ‘주행보조 가능한 차’로 여겨져야 한다.
특히 주행보조의 영단어인 'ADAS'는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약자다. 말그대로 운전자를 돕는 역할에 불과한 시스템이다. 여기서 자율주행의 '자율'을 뜻하는 'Self'단어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스스로 다양한 도로 상태를 파악하고 주행할 수 있어야 '자율주행' 또는 'Self-driving car' 명칭을 쓸 수 있다.
우선 V2X 시스템은, 도로의 돌발상황이 생길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시스템이 장착된 자율주행차라면, 차량 스스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알아서 주행할 수 있다.

만약 V2X 시스템이 장착된 자율주행차의 센서 등이 도로의 땅꺼짐 현상이나 대형 추돌사고 등을 감지하면, 이를 즉각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자율주행 또는 일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사고 내용 등을 수신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경로를 검색해 알아서 주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V2X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양산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에 넥쏘 기반의 자율주행차로 일반도로 주행 테스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 아직 시범주행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수동운전이 필요하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현재 단계에서 자율주행으로 봐야 할까
현재까지도 테슬라 ‘오토파일럿’ 뜻과 해당 기술의 구현 범위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오토파일럿’ 용어가 자율주행으로 연상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테슬라가 구매 단계때부터 오토파일럿 자체가 주행보조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심지어 테슬라가 선택사양으로 판매하는 ‘풀-셀프 드라이빙’ 옵션도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물론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 옵션은 일부 한계가 있는 주행보조 수준에 불과하다. ‘풀-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알아서 고속도로 출구까지 이동이 가능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구현이 된다. 하지만 이 기능을 실행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아직 주행보조 수준에 불과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현재까지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무선 OTA(over-the-air) 업데이트 덕분이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업체와 달리 수많은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자율주행에 가까운 주행보조 기술을 구현시켜준다. 아직까지 국가별로 오토파일럿이 구현할 수 있는 범위는 차이가 있지만,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을 위해 수차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테슬라 방식에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모든 국가 정부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커넥티비티 협약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평생 자율주행이 아닌 주행보조 수준으로 여겨질 수 있다.
현재 테슬라를 넘보는 경쟁업체들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GM의 슈퍼크루즈 기술도 북미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일본에서는 혼다와 닛산 등이 테슬라 등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뿐만 아니라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언맨드솔루션, 토르드라이브, 포티투닷 등의 국내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다. 기존 주행보조와 차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모든 업체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제는 국가별 상황 맞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필요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동화 차량 구현 단계(Levels of Driving Automation)’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SAE는 여기서 총 5단계를 제시했는데 현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중앙유지보조 기능들만 갖춘 차량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요구되는 2단계 수준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수동운전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3단계 수준에 전념하고 있다. 이 때도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수동운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아닌 주행보조의 선진화로 봐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3단계 수준의 주행보조 기술을 갖췄다.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SAE 기준에 맞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서로 경쟁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국가별 지형과 상황, 또는 문화에 맞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다.
관련기사
- [조재환의 카테크] "레벨 3 자율주행” 취득했다는 혼다, 믿어도 될까2020.11.13
- 中 콜택시 디디, 자율주행 면허 획득...로보택시 '성큼'2020.11.13
- 한컴MDS, 美 자율주행SW기업 '코스트오토노머스'와 업무협약2020.11.12
- LGU+, 국내외 업체와 ‘자율주행 전기버스’ 만든다2020.11.11
2단계 수준의 주행보조 가능 차량들은 급커브 구간을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산길 와인딩 구간의 대응도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워낙 산악지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차 등장 시 산길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산길 진입 시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면, 자율주행 또는 주행보조 탑재 차량은 운전자의 수동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또는 주행보조 탑재 차량들의 기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커브 구간에 진입할 경우, 어떻게 속도를 줄이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 원형 로터리 등 고난이도 통과 구간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또 V2X 시스템 구현을 위한 통신 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