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참여도가 높다. 화웨이는 초기부터 제조업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한국도 서둘러야 한다.”
3일 만난 데이비드 W. 버그만 IPC 부회장(Vice Chairman)은 한국이 ‘빨리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제조업 표준 제정에 있어 저만큼 앞서 나가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의미다.
그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5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을 찾아 한국을 방문했다. 국제 제조업 관련 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IPC에서 그는 국제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IPC는 3천700여개 제조업계 회원사가 가입한 비영리 국제표준단체다. 납땜 위치나 부품의 모양과 형태 등 지적재산권으로 일일이 규정하지 않는 각종 규격을 정하고 있다. 또 국제 사회의 여러 규제를 파악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소재와 기술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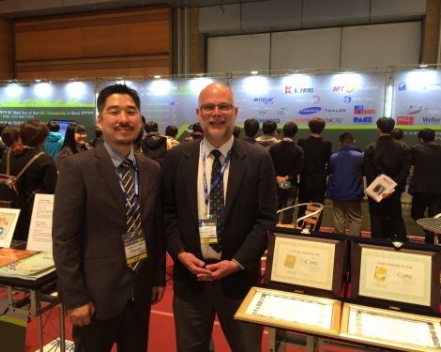
그는 IPC의 강점으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꼽는다. 가령, 한국 기업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 규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수출 대상국의 규제는 다 파악하기 어렵다. IPC의 데이터는 이때 위력을 발휘한다.삼성이나 애플 처럼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어떨까. 버그만 부회장은 “그들 역시 IPC의 데이터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두 업체의 경우 사업을 진행 중인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IPC 같은 외부 기관의 표준이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다. 자체적으로 만든 규격에 맞춰 생산해도 기본적인 생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를 마주했을 때 IPC 같은 외부 표준기관의 데이터가 필요해진다.
그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이 갑자기 부각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만일 이로 인해 환경 단체가 해당 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을 정부에 촉구할 경우, 아무리 대형 제조사라도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며 “이 경우 IPC에 자문을 구한다면 우리가 가진 대체 소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미에서 시작된 만큼 아직은 북미 중심의 표준이 많지만, 중국과 덴마크 등 다른 지역에서 먼저 제안해 표준으로 등재되는 규격도 많다”며 “중국의 경우 화웨이가 IPC의 중국 진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많은 제안을 냈고, 중국 전체로도 PCB를 비롯한 활발한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IPC는 비영리단체로 국제 전자 제조산업의 다양한 규격 제정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다. 본래 미국 워싱턴DC에서 1957년 6개 회원사를 시작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는 세계적으로 60여개국 2천700여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두산 등이 가입해있다.
관련기사
- 다산네트웍스, 항공·방산 통신장비 국산화 나서2015.04.03
- LG전자, LTE 기반 車-사물간 통신 표준 주도2015.04.03
- 국표원, 해외 환경규제 대응 전략 마련2015.04.03
- 한-중, 전자제품 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2015.04.03
특히 인쇄회로기판(PCB)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표준을 개발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회원사 혹은 비회원사에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도 실행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국제반도체표준규격기관(JEDEC)과 인증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등과 제휴를 맺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