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보름째를 맞는 단통법이 상처투성이다. 대통령 공약 이행차원에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본래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다’는 아우성만 들린다. 때문에 법이 시행된 지 겨우 보름이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내놓고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며 정부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부담만 배가시켰다는 원성이 이어지고 있고, 유통점들은 꽁꽁 얼어붙은 구매심리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이다. 법 추진과 시행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대안이 있을 지 4회에서 걸쳐 긴급진단한다.[편집자주]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가계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차별 금지다. 보조금을 사전에 공지토록 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적중했고 하나는 빗나갔다. 소비자 차별은 막았지만 가계통신비는 되레 올랐다.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다.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쏟던 보조금을 쪼개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 통신비를 줄이려면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이 수반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을 강제로 인하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고 또 그런 반시장적인 정책을 취해서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금지할 수는 있으나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점에서 눈여겨 볼 게 ‘보조금 상한’ 조항이다. 과거와 달리 단통법 아래에서는 이 조항이 전혀 불필요하다. 이통사들이 지나치게 보조금을 집행할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차별 금지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를 동시 추진하려면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독려해야 할 상황이었다.
단통법 그러나 이 현실을 정반대로 본 '엉뚱한 규제'가 돼버린 것이다.
■과거엔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했었나
과거 27만원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통사가 특정 이용자에게는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못한 이용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이다.
보조금 경쟁을 하지말고 그 비용을 줄여 요금인하에 써라는 취지였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주요 취지도 같다. 특정 이용자에게만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누구나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단통법이다. 고가요금제 뿐만 아니라 저가요금제에도 같은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조금을 원하지 않으면 이 금액만큼 요금할인도 해줘야 한다. 처벌도 강화됐다.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이통사뿐만 아니라 유통망도 처벌을 받는다.
단통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어차피 과거와 같이 소수 이용자에게만 보조금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만 높아질 경우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할 것을 이통사들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통법이 시행되면 과거와 같이 소수 이용자가 아닌, 전체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이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의 하향평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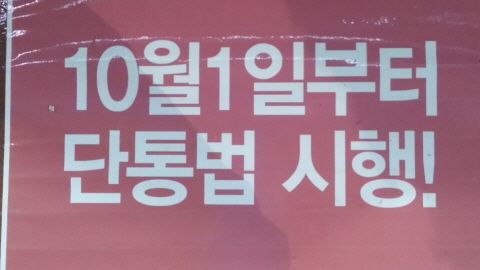
■단통법 아래서 보조금 상한선은 소비자 기만 트릭
때문에 애초에 상한선은 불필요한 제도다. 단통법 하에서는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막힌 트릭이자 함정이다.
소비자들에게 과거 27만원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30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규제로 바뀌면 최소 3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것이란 불가능한 희망만 심어줬기 때문이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경쟁적으로 출혈 보조금을 썼던 이통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조금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음에도 이통사들은 고가요금제에도 10만원 남짓한 보조금을 책정한다. 또 보조금 공시제도가 오히려 이통사들에게 ‘천리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쟁사가 어떤 단말기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 즉 예측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업자간에 경쟁 심리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은 낯설지 않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2G에서 3G, 4G LTE로 넘어오는 동안 마치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판박이 같은 요금제를 내놨었다. 사업자간 요금차별이 거의 없다보니,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더 주는 사업자로 쏠렸다.
그나마 경쟁원리가 작동했던 보조금이 상한선으로 묶이면서, 이통사들은 마치 또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보조금을 유사한 수준에서 하향평준화 시켰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경쟁 심리는 온데간데없고 ‘덜 팔아야 이윤이 남는’ 이상한 경쟁 원리만 작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유일한 경쟁도구였던 보조금을 상한이란 이름으로 제한되면서 사업자간 암묵적 담합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를 넘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 초기나 성숙기로 가는 시장에서는 사업자 간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펼쳐지지만 성숙기를 지나 포화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동통신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5:3:2의 비율이 고착화된 시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과 같은 규제 정책이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조금 상한은 경쟁 활성화 약화 족쇄
올 초 정부는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경쟁 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해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유도, 서비스 경쟁의 발판을 삼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역행하는 제도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유일하게 경쟁원리로 작동했던 보조금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오히려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에서 보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은 보조금 상한선과 같은 규제가 없어도 작동이 가능하다.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완화 정책에도 반한다.
통상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은 후발사업자의 도발로 시작된다. 후발사업자의 혁신은 선발사업자를 자극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점에서도 보조금 상한선은 시장원리를 무력화 시킨 측면이 크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2G→3G→4G LTE로 빠르게 이동해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5천6백만 이동통신가입자 중 약 60%에 이르는 3300만명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 “단통법이 경쟁 죽여…요금인가제 폐지해야”2014.10.16
- 학계 전문가 “단통법, 경쟁 제한하는 악법”2014.10.16
- 단통법, 결국엔 가계 통신비만 높였다2014.10.16
- 단통법 때문에…폰파라치 포상금 확대2014.10.16
하지만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과 KT의 4G LTE 비중은 각각 56.3%, 58.3%인데 반해, LG유플러스의 4G LTE 가입자는 72.3%에 이른다. 즉, 후발사업자들이 새로운 통신서비스 제공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제, LTE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위기감은 매우 컸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과 같은 규제는 후발 사업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새로운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이통사와 이를 대리하는 유통점들의 경쟁적 마케팅 수단을 보조금 상한이라는 덮개를 씌움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 활성화를 약화시키는 족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