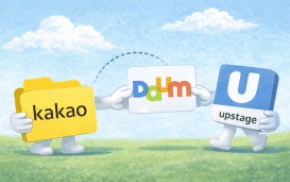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보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마이핀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향후엔 뇌파계(EEG)를 활용한 보안 기술이 주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25일 기즈모도 등 외신은 일본 도야마 대학의 히데야키 교수(생체 공학 부문)가 연구 중인 뇌파 식별 기술이 일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술은 뇌파 중 P300을 분석해 보안 인증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P300은 특정 소리나 사진에 약 0.3초 후 반응하는 뇌파로,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특성은 히데야키 교수가 연구 중인 보안 기술 뿐 아니라 IT 기기 연구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히데야키 교수의 뇌파 보안 기술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지 않아도 P300이라 불리는 뇌파 신호를 활용해 개인 인증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셈. 현재 약 90%의 정확도를 보였다는 게 외신의 설명.

히데야키 교수는 “뇌의 전기 신호는 다른 사람에게 도둑을 맞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라면서 “다양한 생체 신호와 결합해 100% 안전한 개인 식별 기술이 되도록 연구하는 게 목표”라고 외신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UC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뇌파를 인식하는 헤드셋을 활용, 보안 개인 인증에 성공했다고 전한 바 있다. 뇌파 센서가 달린 헤드셋을 착용한 뒤 생각인식(passthought)을 통해 비밀번호 등 본인인증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기술은 EEG센서를 탑재한 블루투스 헤드폰 형태의 뉴로스카이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에러율은 1% 남짓에 불과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뇌파 기술은 보안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뇌파로 생쥐의 꼬리를 움직이거나, 쿼드콥터를 원격 조정하는 기술 등이 차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씨넷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유승식 교수 연구팀이 사람의 생각만으로 생쥐의 꼬리를 조정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뇌-뇌 인터페이스(Brain-to-Brain Interface, BBI)’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각종 기기를 구동시키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to-Computer Interface, BCI)를 활용, 컴퓨터로 전달된 특정 뇌파를 다시 생쥐 뇌의 일부 영역에 신호를 보내는 식이었다. 또한 美 미네소타대 연구팀은 뇌파를 이용해 원격으로 쿼드콥터를 조종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64개의 전극을 부착한 EEG 모자를 활용했다. 왼쪽 주목을 쥐면 뇌 피질에 있는 신경(뉴런)을 자극하고, 이를 인식한 쿼드콥터가 왼쪽으로 도는 식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에서도 뇌파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뉴로피드백 특허 출원수가 급증한 이유다. 뉴로피드백은 사람의 머리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뜻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뉴로피득백 출원 수는 지난 1981년 2건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연간 20여건, 2009년 56건, 2010년 73건, 2011년 76건으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 IBM, 인간 두뇌 닮은 '트루 노스' 칩 개발2014.08.25
- MS, SW개발자 뇌파 추적 실험…왜?2014.08.25
- “구글글래스가 뇌스캔…생각 읽어내 광고”2014.08.25
- IBM 왓슨, 뇌종양 치료 연구 지원2014.08.25
지난 6월 기준 관련 특허를 보면 ‘뇌파 측정 및 분석’ ‘뇌파를 이용한 졸음운전 방지’ ‘스마트 폰과 연동된 뇌파 게임’ 등 응용기술 관련 출원건수가 전체 64.3% 비중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뇌파 관련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사물을 조정하는 등의 연구가 일부 성과를 얻었고, 향후엔 개인 정보 인증에도 뇌파 신별 기술이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