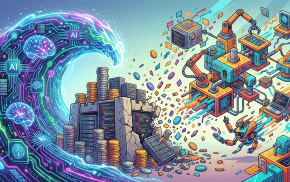우리나라는 고객이 소프트웨어와 개발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와는 다른 잣대로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하는 이중성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런 현상이 꼭 고객 탓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다 보니 고객들은 여기에 길들여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고객이 소프트웨어 환경을 망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자.
A사 고객들은 참을성이 없다.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발견되면 당장 고쳐달라고 막무가내 식으로 요구한다. A사는 팩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개별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당장 고쳐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계획되지 않는 급한 수정을 핫픽스(Hotfix)라고 한다. A사는 특정 몇몇 고객 때문에 핫픽스를 과도하게 많이 만드느라 계획된 개발 일정에 지장이 생겼고 소스코드도 지저분해졌다.
하지만 A사 고객들도 외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요구는 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B사는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서 개발자가 고객사에 방문 사과를 한적이 있다.
B사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버그가 발견되면 개발자를 죄인 취급한다. 가끔은 심각한 버그가 발생하면 개발자의 방문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에 B사는 상황을 쉽게 모면해 보려고 개발자에게 고객을 방문해서 사과할 것을 지시했다.
개발자는 어쩔 수 없이 사과 방문을 했고 개발자로서 회의를 느꼈다. 사실 버그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고 버그가 개발자만의 책임도 아니다.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인데 아직도 버그의 모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를 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차 만든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개발자에게 버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닐까?
C사는 개발자들이 고객 옆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
C사는 솔루션 회사다. 자사 솔루션을 이용해서 고객 요구대로 커스트마이징해서 개발을 해준다. 그런데 주로 고객들은 자사 담당자 옆자리에서 개발을 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개발자들은 다니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여러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환경도 더 좋다.
그런데 고객이 방문해서 개발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스펙도 정하지 않고 옆에 앉혀 놓고 이러쿵저러쿵내키는대로 요구사항을 말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어서 지우고 다시 만들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물론 외국 경쟁회사는 이런 요구에 콧방귀도 안뀌기 때문에 C사는 이런 방문 개발 방식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다. 하지만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과거의 방식을 버려야 더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방식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고객보다도 개발자들이 이 방식에 익숙해져서 내부 개발문화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D사도 고객사에 방문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유가 약간 다르다. 고객이 보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고객사에 방문해서 개발할 수 밖에 없다. 고객사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개발은 모두 고객사에서 해야 하고 고객사를 나올 때는 몸밖에 빠져나올 수 밖에 없다. 사실 이 회사도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와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 고객의 이중성은 여기서도 드러난다.
E사는 유지보수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E사는 솔루션 회사인데 납품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진다. 하지만 고객은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버그를 고치는데 왜 돈을 받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E사의 고객들도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쓸 때는 군말 없이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한다. 외국 소프트웨어를 쓸 때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워런티 계약을 따로 한다. 워런티 비용은 소프트웨어마다 다르지만 매년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의 10%~50%를 지불한다.
1년간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아도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3년간 워런티 계약을 하지 않다가 4년째 문제가 발생해서 지원을 요청하려면 4년치 워런티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지만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F사 고객이 말도 안되는 문서를 수십 종 요구한다.
F사는 SI회사다. 대부분은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꼭 필요한 문서는 아니다. 단지 고객이 제시하는 방법론에서 필요한 문서일 뿐이다. F사는 실제로는 고객 프로세스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주어진 시간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은 그냥 평소대로 하면서 문서만 추가로 따로 만든다. 문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다보니 너무 번거로워서 나중에는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는 프로젝트 도중에도 프로젝트 후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냥 검수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고 검수 시에도 소프트웨어와 문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F사는 고객의 이러한 과도한 문서 요구에 프로젝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정작 개발할 시간이 줄어 들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G사는 패키지를 수정해달라는 고객의 요구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G사 고객들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다. G사도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 소스코드가 여러 벌이 생겼다. 소스코드도 그냥 복사를 해서 고객별로 관리를 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 속도는 점점 늦어졌다. 기능 하나를 수정해도 여러 벌의 소스코드에 적용을 해야 했다.
이렇게 소스코드를 통합(Merge)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나중에는 개발하는 시간보다 소스코드 통합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국 G사는 문을 닫았다. 이는 고객 탓만은 아니고 눈앞의 이익만 쫓는 G사의 무분별한 단기 대응도 문제였다.
요즘 정부도 민간도 소프트웨어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돈을 내고 있는 고객들은 바뀌지 않고 있다. 물론 고객만의 탓은 아니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 개발회사들에 길들여진 것뿐이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환경이 망가지면 결국 고객들도 손해를 본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많이 망가지고 나면 제대로 쓸만한 국산 소프트웨어가 줄어들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싸고 문화도 잘 맞지 않는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써야 한다.
관련기사
- 자신의 전공 코드에 발목 잡힌 개발자들2014.02.10
- CMMI는 회사를 망칠 수도 있다2014.02.10
- 실리콘밸리 개발자 눈에 비친 한국 SW회사2014.02.10
- 개발 프로세스 관료화의 함정2014.02.10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한다. 사실 별 뾰족한 답도 없는 문제지만 결국 고객을 바꾸는 것은 개발사들이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고 해도 경쟁사에서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경쟁에서 밀리고 만다.
결국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보다 노예식 개발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전략은 모두를 다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자.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선두 주자들부터 소프트웨어 환경을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면 고객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