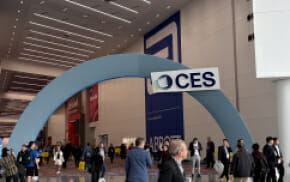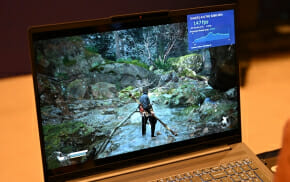IT인프라를 형성하는 하드웨어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세 영역은 지난 20여년 동안 굳건한 장벽을 쌓아왔다. 각자의 시장이 있었고 시장의 강자도 달랐다. 저마다의 영역을 가진 강자들을 실리에 따라 연합과 배신을 반복하며 공생했다.
그러던 IT업체들의 태도가 돌변한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점은 서버업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부터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오라클 인수를 정점으로 서버 시장은 IBM과 HP의 양강구도로 정리됐다.
IBM과 HP는 서버시장을 양분한 뒤 스토리지 시장을 넘보기 시작했다. 서버업계에 마련됐던 치열한 전장이 스토리지 시장으로 옮겨간다. EMC, 히타치데이터시스템즈(HDS), 넷앱 등이 경쟁해온 시장이다. 여기에 델도 합류했다. 현재 IT업계의 전쟁터는 이곳이다.

■서버 강자의 스토리지 전쟁 ‘쉽지 않다’
유닉스의 IBM, x86의 HP. ‘서버’ 하면 떠오르는 두 회사다. 오라클, 델이 판도변화를 이끌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IBM과 HP의 양강구도다.
이전까지 서버 시장은 수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썬, IBM, HP, 델, 컴팩, 후지쯔, 슈퍼마이크로, 유니시스 등이 선수로 통했다. 컴팩은 일찌감치 HP에 흡수됐고 썬은 오라클에 인수됐다. IBM과 HP가 각각 유닉스와 x86서버 시장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여러 업체가 나눠 갖는 형국이다.
서버를 접수한 IBM과 HP는 다음 공략지로 스토리지 시장을 주목한다. 스토리지 분야엔 서버 전쟁의 파트너였던 EMC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다. IBM과 HP는 자체 스토리지 솔루션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동시에 중대형급 스토리지업체 M&A를 반복하며 포트폴리오를 꾸렸다.
여기에 델도 동참한다. 이퀄로직, 컴펠런트, 오카리나 등으로 델 스토리지 제품군을 갖췄다. 그 과정에서 HP와 델은 3PAR를 두고 치열한 인수전을 벌이기도 했다.
IBM은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뒀다. 미드레인지급 시장에서 EMC에 이은 2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HP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디스크 스토리지 분야만 시장 1위를 다툰다.
IBM, HP, 델은 모두 알짜배기인 공공, 금융 등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다. 여전히 하이엔드 시장은 EMC와 HDS의 무대다. 희망적으로 보였던 미드레인지 시장도 넷앱이란 신흥강자의 급부상과 함께 치열해졌다.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스토리지 아키텍처 상의 문제다. 컨트롤러가 2개인 미드레인지 제품으로 컨트롤러 8개의 EMC, HDS와 경쟁하려다보니 고객 니즈를 맞추기 어렵다.
스토리지란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지적된다. 스토리지는 서버에 비해 더 깊이 있는 전문성과 여러 노하우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내부 역량에서 기존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 IBM, HP, 델 등이 자체 솔루션 개발보다 M&A에 더 치중하는 건 포트폴리오 확장뿐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도 노린 것이다. 외부에서 수혈한 인력이 새로운 기업문화에 완전히 적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부족한 서비스 역량도 약점으로 꼽힌다. IBM이나 HP는 EMC나 HDS처럼 거대한 서비스 조직을 꾸리기 어렵다. 전체 서비스 조직에 스토리지 인력을 포함시킬 수는 있어도, 스토리지만 전담하거나 특정 고객에 상주하는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현상은 미국을 벗어난 지사일수록 더욱 심해진다.
일단 3사가 앞세우는 장점은 통합이다. 서버와 스토리지를 일체형처럼 만들 수 있고, 서비스 지원을 단일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라 최적화 역량도 회사내부 협업모델이 기업간 협력모델보다 높다고 강조한다.
국내에 진출한 서버업체 관계자는 솔루션의 경쟁력보다 시장과 고객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내에서 한국EMC의 유독 강력한 벽을 형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전쟁, 아직은 잔잔한 바람
스토리지 시장 진입 과정에서 HP, IBM, 델 등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과 함께 네트워크 시장도 새로운 전쟁터로 변모할 조짐을 보인다. 시스코시스템즈의 텃밭을 노리고 IBM, HP, 델 등은 데이터센터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위해 HP는 쓰리콤, IBM은 블레이드네트웍스테크놀로지(BNT), 델은 포스10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3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솔루션을 모두 갖췄다고 강조하게 됐다.
하지만 네트워크 시장은 스토리지보다 아직 더 조용한 편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HP가 돋보이는 편이지만 전체 사업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는 HP에게 여전히 서버와 스토리지 사업의 부수적 존재에 속한다.
현재 네트워크 공룡 시스코의 점유율을 끌어내리는 건 HP가 아니라 주니퍼네트웍스, 브로케이드, 아리스타 등 기존 네트워크업체와 화웨이, ZTE 등 중국업체다.
IBM은 BNT의 톱오브랙스위치(TOR)를 최근 발표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일체형 제품 ‘퓨어시스템’에 적용하고, 소프트스위치인 ‘분산형 버추얼 스위치(DVS) 5000V’를 막 내놨다. IBM 역시 네트워크 사업 전반에 나서기엔 솔루션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델은 더 존재감이 없다. 포스10 인수후 기존 파워커넥트와 함께 네트워크 제품군을 꾸렸지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로 내놓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인 ‘디스트리뷰트코어’는 네트워크 패브릭을 실현했지만 인지도가 매우 낮고 아직 초기 개발단계다.
3사의 국내지사를 보면 네트워크사업에 대한 이들 기업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다.
관련기사
- 스토리지 시장, 전문업체가 강한 이유2012.05.09
- 한국 서버시장 대혼전 예고2012.05.09
- '오픈플로' 네트워크업체의 미래 흔들다2012.05.09
-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3사 건강상태는?2012.05.09
HP는 세계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사업조직을 ESSN(엔터프라이즈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으로 운영한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한국HP ESSN에 네트워킹사업부가 꾸려져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반면, 한국IBM이나 델코리아의 경우 네트워크 전담조직이 없다. BNT는 IBM 시스템&테크놀로지그룹(STG) 시스템x사업부에 속한다. x86서버 사업부서의 일부인 것이다. 델은 포스10에 대한 조직정비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