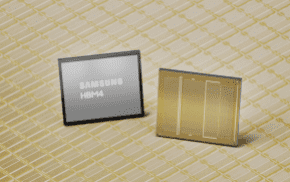지키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저작권 세계는 이렇게 나뉜다. 그런데 저작물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자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창작물을 공유할 때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CC)는 이러한 취지의 문화 운동이다. 창작물 공동자산화에 대한 긍정적 의사표시방식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CCL)를 도입,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다름아닌 현직 부장판사다.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CC운동의 본부 격인 CC코리아를 설립한 때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판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학술 모임인 한국정보법학회의 총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 교류를 하게 된 미국CC가 한국지부 설립을 제안했고, 평소 IT에 관심이 많던 윤 판사가 자연스럽게 중책을 떠안았다.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다. 윤 판사가 CC홍보를 위해 만든 홈페이지는 개설되자마자 악플로 시달려야 했다.
“양복입은 사람들이 일종의 ‘무브먼트’를 할 수 있겠냐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시작한게 맞아요. 막연히 ‘알려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욕 먹은 덕분에 공부는 철저히 했습니다.”
윤 판사는 법복을 벗고 바깥으로 나와 발품을 팔았다. 당시 영향력 있던 파워 블로거 10여명을 모아 놓고 ‘뜻을 함께 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렇게 태동한 이 운동의 발런티어(자원활동가)가 이제 국내에서만 200여명이 훌쩍 넘는다.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회원도 100명에 달한다.

“CC운동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CC코리아 상근직이 둘 뿐이고 회원과 인턴들에게 몇기와 같은 말을 붙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죠. 굳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기에는 착실한 실천도 따라오죠.”
자랑할 만한 성과는 더 있다. 다음과 네이버, 파란, 야후코리아, 등 국내 주요 포털이 잇따라 CCL 마크를 도입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도 CCL을 쓰고 있다.
덕분에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CCL 표식을 익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국은 전세계 CC본부가 있는 70여개국 중 CCL 확산이 가장 빠른 나라다. 그러나 윤 판사의 고민은 남았다. “일단 CCL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왜 CCL을 써야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CC 라이선스 수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지만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사용가능’ ‘원저작물 변경 금지’ 등의 조건을 가장 많이 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 CC 친구들은 이를 두고 역시 한국은 ‘다이내믹’하다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웃음)”
윤 판사의 바람은 간단하다. CCL이 단순히 유행이 아닌 의식있는 습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그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CC코리아가 최근 개설한 ‘렛츠씨씨닷넷(http://letscc.net)’은 그 일환이다. 해당 사이트에선 사람들이 CCL을 활용한 이미지, 동영상, 문서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들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붙여놓은 표식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얼마 전에는 사진, 애니메이션, 드로잉, 현대음악 등 4개 분야의 창작자들이 직접 소셜펀딩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행사에 쓰인 작품들을 CC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배포하는 전시를 열기도 했다. 이 작품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리믹스(Remix)될 수 있다.
윤 판사는 이처럼 콘텐츠 창작자가 CC운동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제껏 CCL이 창작자의 권리를 방해하고 돈을 못 벌게 한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가수 조PD와 장기하와 얼굴들 등이 음원을 무료로 공개한 일도 얘기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자신의 음원에 대한 소유권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과 창작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단순히 저작권료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잘나가는 판사가 웬 ‘꿍꿍이’냐는 시선을 받아야 했다. 돈을 벌어다주는 일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외롭지는 않았으나 외길임은 분명했다. 그래도 묵묵히 해왔다. 윤 판사가 CC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
관련기사
- FTA 저작권법, ‘인터넷 괴담’ 부르는 이유2011.12.27
- “맘껏 즐기고 재활용”…신개념 문화 축제 18일부터2011.12.27
- 다음 CCL검색 “저작권 허용수위 따라 검색”2011.12.27
- KAIST-CC코리아, CCL 업무협약2011.12.27
“CC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자 수단일 뿐이예요. 저작물을 공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혁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CC코리아의 파운더이지만 따로 파낸 명함 한 장 없다. ‘1호 CC활동가’. 그가 불러달라는 직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