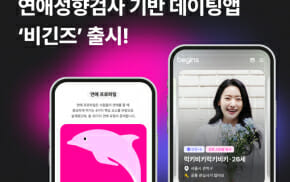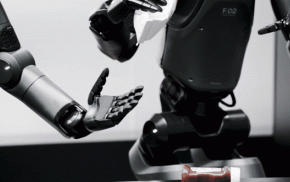요즘은 남녀노소,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휴대폰을 갖고 다닌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기능, 어떤 모양의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가입비에 조금만 보태면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을 때만 해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휴대폰을 교체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대적인 할인 혜택이 없어져 30~4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폴더형에서부터, 8줄로 액정화면이 보이는 초소형,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된 컬러형, 기계적인 음보다는 음향이 보다 풍부한 스피커형에 이르기까지 거금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물론 휴대폰을 교체해야 할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것이다.대부분의 경우 휴대폰 분실을 첫번째 핑계로 댄다. 잊어버렸으니 당연히 새로 구입해야 하고 새로 살 때 평상시 눈여겨 본 신형 모델을 구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석연치 않는 것은 평상시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차라 좀 구린데가 있어 보인다. 물건에 정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홀하게 되고 분실이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두번째는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라고 한다. 고장나서 수리하러 갔더니 엄두가 나지 않아 아예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핑계다. 이 경우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다. 휴대폰을 처음 사용할 때만해도 애지중지 하더니, 가면 갈수록 부주의하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깔고 안기도 하고, 때론 화가 났다고 던지기도 한다. 그나마 고장나지 않았으면 며칠 뒤 분실됐을 것이다.세번째는 통신회사에서 신형으로 바꿔주는 행사를 통해 거의 무료로 교체했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다. 물론 이 경우는 아주 구닥다리의 모델을 갖고 있을 때에 한하며, 그간 놀림과 소외감에서 해방되는 기분을 맛보게 된다. 조금 동정이 가는 핑계다.네번째는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다. 생일 선물로 애인이 사줬다거나 업무를 위해 회사가 사준 경우다. 그러나 이런 휴대폰이 최신형으로 그간 판매점을 맴돌며 눈여겨 본 휴대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마지막으로는 전화번호를 바꾸기 위해 새로 휴대폰을 샀다는 핑계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대는 통에 더 이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 경우다. 실제 연예인이거나 자칭 연예인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아니면 잠복 경찰이거나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악의 경우는 빚 독촉에 쪼들리거나 그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다.이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휴대폰을 새로 장만한다. 사실 전화 통화라는 고유의 기능은 변함이 없지만 모양과 색깔, 기능과 휴대성 등에 따라 새로운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21세기 풍속도라고 할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이라는 구호아래 B2B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용 시장 공략, 신세대 및 여성 공략 마케팅,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증대 등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시장 확대 전쟁에 휩쓸려가는 모습이기도 하다.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휴대폰은 생활의 편익을 위한 선택 품목에서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폰은 N세대들의 액세서리로, 주문형 비디오(VOD), 인터넷 방송, 전자책(e-book)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망망대해에서 구사일생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은 옛말이 됐다.불과 몇 년만에 필자도 휴대폰을 네차례나 바꿨다. IMT-2000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휴대폰이 내 손을 거쳐 갈지 감히 상상이 안된다. 가끔 책상 정리라도 할라치면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호출기처럼 몇 년 뒤 휴대폰도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다.아직도 우리가 검은색의 흉기라고 일컫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휴대폰을 통한 다양한 개성 표현과 이동전화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축을 충실히 따르는 우리네 문화와의 대비를 느낀다. @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