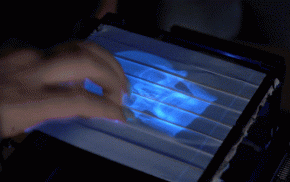한국에도 본격적인 캐리어이더넷 시장이 열리고 있다. 모바일 백홀에 도입됐던 캐리어이더넷은 올해부터 국내 통신사의 핵심 유선 인프라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장비업체 간 경쟁도 본 경기에 돌입했다. 외국계 장비업체는 만반의 준비를 이미 마치고 시장 개화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반면 국산 장비업체는 올해 상반기 중 제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시도한다.
캐리어이더넷은 패킷전송네트워크(PTN)으로도 불리며, 모든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이더넷 프로토콜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이더넷과 T1, E1 등의 프로토콜을 함께 처리했던 MSPP 대신 이더넷으로 모든 전송망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다.

■캐리어이더넷 표준화는 일단락
캐리어이더넷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 이더넷을 광대역네트워크(WAN) 구간의 전송망에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운용, 관리, 유지보수(OAM) 등에 단점을 갖고 있던 이더넷의 안정성과 장애복구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측면에서 전송 기술은 링구조를 사용한다. 특정 경로가 장애를 일으키면 즉각 다른 경로로 전송하게 한다. 반면, 이더넷은 스패닝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로 수정이 느리다. 캐리어이더넷은 광전송의 OAM 기능과 이더넷의 가격대비성능을 단일장비에 담아낸다.
캐리어이더넷은 크게 두 갈래의 표준으로 나뉜다. ITU-T 중심의 MPLS-TP 방식과 IETF 중심의 MPLS 계열 기술이다. ITU-T는 알카텔루슨트, 화웨이 등 전송업체 진영이며, IETF는 시스코시스템즈, 주니퍼네트웍스 등 라우터업체 진영이다.
때문에 ITU-T 방식과 IETF 방식은 출발점이 다르며, 기술적으로도 판이하다. 하지만 작년 11월 두 방식 모두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서 표준화 경쟁은 일단락됐다.
국내 통신사의 경우 2010년 SK텔레콤이 PTN을 모바일 백홀망에 도입했고, 작년부터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유선 네트워크에 대한 시범적용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SK브로드밴드는 알카테루슨트를 주사업자로 지정하고, 기업고객 대상 전국망을 PTN방식으로 구축한다. KT는 작년 알카텔루슨트 장비를 이용해 서울일부 지역에 시범적용했고, 지난달부터 국산장비업체의 PTN 장비의 성능검증에 돌입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기간망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작업을 시작했다.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4대 통신사업자의 캐리어이더넷 구축사업은 사실상 올해말 이후 본격화된다. 여기에 한국알카텔루슨트, 화웨이코리아, 에릭슨LG, ZTE코리아, 시스코코리아 등 외국계업체와 SNH,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다산네트웍스, 유비쿼스 등 국내업체들이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끝나지 않은 국산화 논쟁
지난해 국내업체들은 통신사에 캐리어이더넷 도입 시점을 늦춰달라고 주장했다. 관련 표준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국내업체의 캐리어이더넷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지연전략을 편 것이었다.
국내업체들의 지연전략은 통신사의 네트워크투자가 LTE 등 무선망에 집중된 시점과 맞물리며 성공한 셈이 됐다.
캐리어이더넷은 이더넷과 전송 기술 모두를 갖춰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국내업체들은 전송과 이더넷 중 하나에만 특화하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캐리어이더넷에 대한 대응이 뒤처졌다.
국내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자본력을 갖고 있는 해외업체에 비해 국내업체는 대형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웠다”라며 “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며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업체들의 캐리어이더넷 기술은 소용량과 중용량 장비를 상용화한 수준이며, 통신사 기간망을 위한 대용량 장비는 개발단계다. 일부 업체가 대용량 장비의 상용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성능검증 결과가 나와야 공인될 것으로 보인다.
캐리어이더넷의 국내 도입에 남은 논쟁거리는 거의 없다. 이제 남은 건 외국산을 쓸 것이냐, 국산을 쓸 것이냐 정도다. 한국 네트워크의 국산화와 국산장비 살리기를 내건 국내업체의 입장과, 기술성숙도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앞세운 미국, 유럽계 업체,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전면에 세운 중국계 업체의 대결구도가 형성돼 있다.
관련기사
- SK브로드밴드, 캐리어이더넷 전국망 구축2013.02.14
- 시스코, '광전송+이더넷' 통합 행보 가속2013.02.14
- 알카텔-루슨트, SK텔레콤 모바일 백홀망 구축2013.02.14
- 화웨이, SKT에 캐리어 이더넷 백홀 장비 공급2013.02.14
한 외국계 네트워크장비업체 관계자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건 국산이냐 외국산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느냐다”라며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주장은 소모적인 논쟁을 부를 뿐이며, 철저한 성능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네트워크장비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통신사업자가 국내업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국산장비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