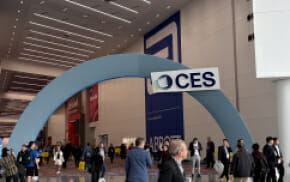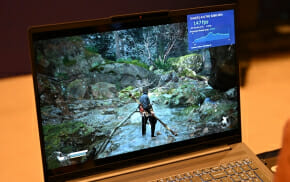"2015년만 해도 기술적 어려움으로 '발사체 그림이 안 보인다' 할 정도였다. 지난해 1단 엔진 연소 시험을 할 때에도 정말 두렵고 암울했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이 확인된 후 기자들에게 밝힌 소회다. 고 본부장은 2015년부터 발사체 개발 책임을 맡아 왔다.

고 본부장뿐 아니다. 12년 동안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사업 유종의 미를 거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 관계자들은 모두 차분한 듯 하면서도 들뜬 모습으로 성공의 기쁨을 누렸다.
우리나라 30년 우주 개발 역사의 한 막을 마무리하는 현장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인 고체엔진 기반 과학로켓 개발이 시작된지 30년째 되는 해다. 액체로켓인 과학로켓 3호 개발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는 아무 기반이 없던 상황에서 세계 7번째 상용급 위성 발사체를 가진 나라가 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을 선언하며 "발사체 기술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오랜 기간 땀과 눈물, 열정을 쏟은 모든 연구원과 기업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항우연 연구진과 누리호 개발에 동참한 기업 연구 인력은 지난주 산화제 탱크 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힘을 합쳐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할 때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우주 산업 클러스터 육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생적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른바 '뉴 스페이스' 정책이다.
또 달 탐사선을 발사하고 미국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우주 기술도 심화 확대한다.
관련기사
- 마침내 날아오른 누리호, 숨가빴던 일주일2022.06.21
- 누리호 발사 성공…대한민국 우주 시대 열었다2022.06.21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누리호 발사 성공"2022.06.21
- 눈앞으로 다가온 '피지컬 AI'…CES 2026이 증명했다2026.01.11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성공은 첫 걸음 뗀 것과 같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면 주춤하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주 통해 도전적이고 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