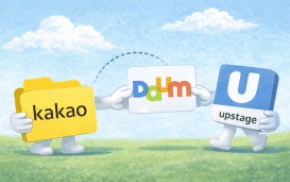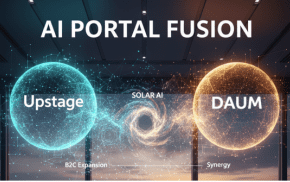멀티미디어 트래픽 확산과 망중립성 논란속에 미국에서 인터넷망사업자(ISP)와 콘텐츠전송네트워킹(CDN) 사업자간 트래픽 과금 논쟁이 급부상했다.
ISP가 CDN 사업자들에게 회선 사용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게 골자다.
바다건너 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한국도 인터넷 스트리밍 영상과 스마트TV 등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전송이 늘어나고, 망중립성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쓴 만큼 내라” VS “망중립성”
미국발 ISP vs CDN 사업자간 과금 논쟁은 케이블TV사업자이자 인터넷망사업자인 ‘컴캐스트’와 CDN서비스업체 ‘레벨3’간 힘겨루기가 발단이 됐다.
사건의 시작은 CDN 업체인 레벨3가 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와 DVD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계약 이후 넷플릭스 이용량이 급증하자 레벨3는 자사망이 아닌 컴캐스트 인터넷망을 빌려 CDN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
그러자 컴캐스트는 레벨3 측에 트래픽 폭증에 대해 이전보다 2.5배의 요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아카마이 등 다른 CDN서비스 업체들도 트래픽 폭증에 따른 요금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레벨3는 망중립성을 앞세워 맞불을 놨다. 이 회사는 “컴캐스트가 망중립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컴캐스트와 상호접속계약 대신 체결했던 회선사용계약에는 트래픽별 요금상승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계약위반임을 주장했다.
■누구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이번 두 회사의 갈등은 망중립성 논쟁으로 번질 태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조만간 표결에 붙일 예정인 가운데 업계의 촌각도 곤두섰다. FCC의 입장이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과금에 부정적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도 주목 대상이다.
ISP와 CDN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다. 통신망을 보유한 ISP들은 망구축에 따른 부담을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CP)들과 나누고 싶어한다. CP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 통신사만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망의 트래픽이 갈수록 한계치에 이르는 것도 이같은 생각의 또다른 근거다. 고생해서 길을 닦고도 실제수익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다 인터넷망의 트래픽 폭증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억지로 길을 넓혀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반면, CP의 경우는 트래픽 과금에 따른 망사용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더구나 트래픽 증감추이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래 비용부담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업성 예측이 복잡해진다는 문제도 생긴다.
망중립성과 트래픽 과금에 대해서는 CDN업체에게도 민감한 문제다. CDN업체는 CP들의 콘텐츠 전송을 대행하지만 통신사에게 망이용료를 지불하는 직접적인 주체다. 트래픽을 중간에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자칫 중간에서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결국 CP와의 계약금액도 인상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일차적으로 유료서비스의 요금인상과 무료서비스의 축소가 예상된다.
국내 CDN업체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CDN사업자는 분산 컴퓨팅시스템을 통해 트래픽을 조절한다”며 “아이폰 등 스마트폰 보급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폭주가 문제되면서 이같은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CDN업체들은 현재 트래픽 증가에 대한 사전준비쪽으로 문제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법제화 논의가 이제 막 시작단계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트래픽 증가에 대한 사전예측과 협의로 준비지원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