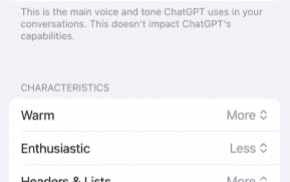법적 지위를 놓고 스마트TV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방송發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MVNO가 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스마트TV는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될 수밖에 없는 방송서비스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스마트TV의 옛 버전이라 할 수 있는 과거 오픈IPTV나 개방형 프리IPTV로 불린 TV포털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방송·통신·인터넷업계의 최대 핫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점은 명백하다.
■오픈IPTV·365℃ 논란 재현 불가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였던 셀런과 함께 만든 오픈IPTV는 지난 2008년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함께 IPTV 사업권 획득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당시 허가심사 결과에서는 오픈IPTV가 재정적 능력 심사에서 점수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변에서는 0.5점 차이로 탈락한 오픈IPTV가 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사업에서 콘텐츠 제공 능력이나 융합서비스 관점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매몰돼 설비투자 위주의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방송통신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365℃’ 역시 망 보유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잊혀졌다.
365℃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 LG전자, CJ인터넷, GS홈쇼핑, 판도라TV, 조인스닷컵 등의 사업자들이 모여 ‘디지털TV 포털 포럼’을 구성하고 내놓은 프리IPTV 서비스다. 하지만 유선 네트워크 기반이 없는 사업자들이 모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스마트TV 역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동일 사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망의 보유 없이 제공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구글TV, 애플TV에 이어 삼성전자도 바다 플랫폼을 얹은 스마트TV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스마트TV의 성공적 런칭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TV, IPTV·디지털케이블TV와 뭐가 다른가
스마트폰이 휴대폰 시장에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스마트’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스마트TV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서비스 명칭만 다를 뿐 디지털화·양방향서비스로 진화해 가는 IPTV나 디지털케이블TV 등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질 않고 있다.
스마트TV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운영체제(OS)가 설치된 TV에 인터넷을 연결해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또 여기서는 기존 실시간 방송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메일뿐만 아니라 전화, 쇼핑, 위치정보 등과 같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IPTV나 디지털케이블TV에서도 제공되거나 제공될 서비스다. 또한 스마트TV가 TV뿐만 다양한 단말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점도 방송통신업계에서 준비 중인 멀티스크린 전략인 ‘N스크린’ 서비스와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기존 유료방송이 특정사업자의 테두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인 월드가든 서비스라는 점에서 개방형 정책을 따르려는 스마트TV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스마트TV가 기존 방송사가 콘텐츠를 수급해 제공하는 형태에서 스마트폰에서와 같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고 해도, 그 주된 수익이 광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방송사와 큰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지상파방송의 시장지배력이 커 향후 실시간 방송 콘텐츠가 스마트TV에 탑재될 경우 최근 논란이 된 지상파-케이블 간의 재송신 이슈나 저작권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슈가 스마트TV로 옮겨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IPTV나 디지털케이블TV와 큰 변별력을 느끼지 못한다”며 “스마트폰이 이동전화시장에 데이터 서비스 확산의 촉매 역할을 한 것처럼 스마트TV가 기존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큰 파괴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