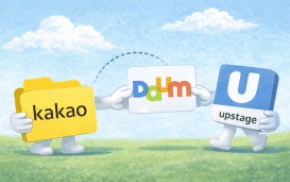2000년대 초반 이후 대한민국 포털업계 주연은 NHN으로 굳어졌다. NHN은 닷컴 거품을 극복하고 거침없이 질주, 2008년 ‘매출 1조원’이라는 대 기록을 작성했다.
이제 NHN에게는 ‘벤처’ 대신 ‘대기업’이란 타이틀이 붙었다. 거대해진 조직의 움직임 하나에 증권가는 들썩인다.
이에 따라 NHN에게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벤처시절 내세웠던 ‘젊음’이란 이미지를 버리지는 않더라도, ‘성숙함’이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침체 대응해 더 고도화된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숙제라는 업계 설명이다.
김상헌 NHN 신임 대표도 이같은 목소리에 공감했다. 7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상헌 대표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성숙한 NHN을 설명했다.
■젊음에 '노련함' 더한다

판사 출신으로 1996년 LG그룹 수뇌부서 일한 김상헌 대표는 2007년부터 ‘경영고문’으로 NHN과 인연을 맺었다. 2008년 NHN 경영본부장을 맡았고, 2009년 4월 대표 자리에 올랐다.
김상헌 대표가 이제까지 살펴본 NHN은 직원 한명씩을 볼 때 외부 파트너와의 소통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젋다’라는 말의 부정적 뜻인 ‘경험부족’이 보였던 것. LG그룹 시절 발로 뛰어다니며 여러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김상헌 대표에게 ‘파트너 소통’은 전문분야다.
“밖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이 거만 혹은 답답하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제안에 대해 순진한(?) 직원들이 주저하며, 적극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서비스 개발에만 충실하다보니 외부 파트너와의 소통 노하우는 더 키울 데가 있습니다”
덕분에 NHN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떨어지게 됐다. 김상헌 대표는 직원들의 소통 능력을 기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회사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포털들은 분명 성장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히 임원진 몇 명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원들이 따라 온다고 극복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발로 뛰며 우군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버는 사업의 일부일 뿐
구체적인 새 먹거리 창출 계획에 대해 물었다. 불황의 시대에 NHN의 차세대 전략은 포털업계 최고 관심사 중 하나다.
김상헌 대표는 우선 ‘플랫폼 확장’을 답으로 제시했다. 네이버 이외에도 누리꾼들에게 여러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겠다는 것. ‘네이버가 회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NHN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그동안 네이버나 한게임을 키우면서 길러온 인터넷 운영 노하우도 사업 모델이다. NHN은 서버만 2만대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다.
“NHN만의 인터넷 운영 기술들을 상품화, 국내와 해외 모두 공략할 계획입니다. NHN만큼의 고도화된 인터넷 운영 기술을 가진 곳은 결코 많지 않기에 희망적입니다”
NHN은 이달 회사를 물적 분할, 인터넷 운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NHN IBP’라는 법인을 세웠다. 최휘영 전 대표가 이끌고 있다.
해외사업 설명도 나왔다. 특히 창업자인 이해진 CSO가 이끌고 있는 일본 포털시장 진출 준비가 주목받고 있다. 김상헌 대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본판 네이버 출범이 올 여름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김상헌 NHN 대표 “저작권자-포털 상생”2009.04.08
- 수장 바뀐 NHN·다음, 변신폭은?2009.04.08
- 점유율 2% 다음의 반격...업스테이지가 그리는 차세대 AI 포털2026.02.02
- [르포] "위험작업 버튼 하나로"…KIRO서 본 '현장형 로봇'2026.02.02
김상헌 대표는 여가시간을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으로 보낸다고 한다. 그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열혈(?) 팬으로도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경영전문가’라는 다소 딱딱한 이미지를 생각하면 의외일 수 있다.
“애니메이션처럼 재미있는 인터넷을 만들겠습니다. 뉴스캐스트와 오픈캐스트도 ‘재미있는 서비스’라는 모토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물론 양질의 정보 제공을 전제하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