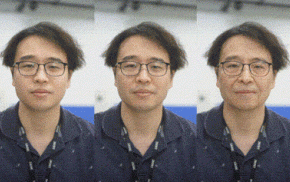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물의를 빚은 구글이 출판 업계와 또다시 충돌을 빚고 있다.지난 6월 5일, 독립 의원 그룹인 ‘All Party Internet Group’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에 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출판협회의 저작권 담당 변호사인 휴 존스는 “도서관의 장서는 대부분 저작권이 보호된 것이며 이것을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구글은 서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색인을 붙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공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출판 업자들에게는 서적을 출간하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검색 엔진은 훌륭한 것이지만, 도서관의 서비스와 출판사의 서비스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존스는 덧붙였다.‘구글 프린트(Google Print)’였다가 “구글 북 서치(Google Book Search)’로 명칭이 바뀐 이 프로젝트는 2004년에 시작됐다. 이 계획은 금새 논쟁거리가 됐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된 상태다.이에 대해 구글 유럽의 대표인 레이첼 훼트스톤은, 저작권이 보호된 서적은 2~3 페이지밖에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출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적의 60% 이상은 저작권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훼트스톤은 설명했다. 또한 구글은 이 프로젝트가 광고 효과와 더불어 서적을 어디서 구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출판사의 매출 증가를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적을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일부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므로 서적을 구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구글이 서적의 표시 방법을 궁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적을 검색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작품 전체의 색인을 작성한다. 그리고나서 작품의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출판협회 측 변호사인 존스는 “구글은 서적 전체를 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훼트스톤은 “그것이 없으면 검색 엔진이 작동할 수 없다. 우선 스캔하고, 그 후에 색인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존스는 “저작권 침해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저작권 소유자이지만, 구글은 저작권 소유자와 상의하지 않고 대량의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고 있다. 구글과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은 서적의 완전한 복제를 소유하고 다수의 도서관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이에 맞서 훼트스톤은 “구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프로젝트의 시비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대답했다.대영 도서관 관장인 린 브린들리는 구글과 기존의 출판계가 대립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검색 엔진과 저작권 소유자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브린들리는 말했다. ‘Laurence Kaye Solicitors’의 로리 케이는 브린들리의 의견을 거들어 “상업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출판사들은 작품의 내용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타사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구글은 자사는 콘텐츠 제공 업체가 아니고, 타사의 콘텐츠의 중개자라고 주장했다.“구글은 타사의 콘텐츠를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한 심부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콘텐츠를 이용하고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염려는 이미 해결됐다”고 훼트스톤은 강조했다. @
지금 뜨는 기사
이시각 헤드라인
ZDNet Power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