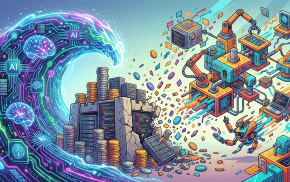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io)이 회사,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체 제품이라도 종류에 따라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 크기 등의 사양뿐 아니라 전자파 흡수율을 살펴본 뒤 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사실은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통위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국내서 팔리는 13개사 전체의 모든 모델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전자파를 내는 휴대전화는 디지탈엠택 제품(DPS-C1000)으로 SAR이 1.50W/㎏(이하 단위 생략)에 달했다. LG전자의 KP7200 제품도 SAR이 1.47로 높았으며, 삼성의 SH-X9850도 1.45에 육박했다. 현재 정부는 전파법 규정에 따라 SAR 기준이 1.6 이하인 경우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사실상 기준에 거의 육박한 상태다. 반면 SAR이 가장 낮은 제품은 브이케이가 만드는 제품(VK200C)으로 SAR이 0.316에 불과했다. 같은 휴대전화지만 전자파 흡수율이 4.7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SAR이 들쭉날쭉했다. 삼성의 경우 SAR이 가장 낮은 제품(SPH-V4200)은 0.424로 다른 제품의 3분의 1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능이 많이 장착된 휴대전화일수록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 전자파 차단 코팅 여부 ▶ 안테나 위치 ▶ 케이스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전자파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무화된 SAR 공개 제도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각 회사들이 홈페이지에 각 제품의 SAR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크기, 무게, 가격 등 다른 제품 정보와 함께 명기해 놓지 않고 별도 코너에 들어가 찾아 보도록 만들어놔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서상기 의원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좀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뿐 아니라 제품 설명서 등에 다른 사양과 함께 SAR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지금 뜨는 기사
이시각 헤드라인
ZDNet Power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