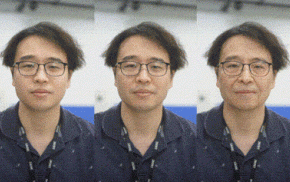데이터 네트워크 진영이 방송에 익숙할 리가 없다. 데이터 네트워크는 커뮤니케이션을 주된 기능으로 발전해 온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방송과 통신의 통합에서 CATV를 운영해 온 방송 진영이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또 한편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원죄는 물론 데이터 네트워크 쪽에 있다.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는 일에만 치중했지, 정작 이렇게 늘어난 대역폭에 무엇을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다.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떠들기 좋은 최고 속도 향상'에 투여한 노력의 조금이라도 떼서 음성이든 비디오든 가능한 만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에 투여했다면, 현재의 상황은 또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기술적인 안정성 뿐만 아니라 컨텐츠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도 지금과 달라진 위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사실 CATV의 이런 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비디오·오디오·데이터를 한꺼번에 서비스하는 트리플 플레이 네트워크(Triple Play Network)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xDSL을 포함한 순수 IP 기술보다 CATV가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CATV는 컨텐츠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현재 상태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이야기한다면, 현재의 진행 방향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용자들에게는 백본 기술이 무엇이고, 어떤 케이블을 통해 자신의 집안으로 서비스가 들어오는지는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다. NGcN이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면,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가 데이터 서비스와 함께 전달돼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방송 진영에서 "너희들이 방송을 아느냐"라고 다그쳐 물으면, 데이터 네트워크 진영이 얼마나 자신있게 대답할지는 알 수 없다.하지만 NGcN을 방송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로 보는 것은 충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NGcN은 차세대 방송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너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혹은 방송을 어떻게 네트워크에 실어 보낼 것인가에만 치중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현재 데이터 네트워크 진영이 걱정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모진 고생을 하며 발전시켜온 국내 네트워크 기술과 장비들이 그 빛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수많은 네트워크 업체들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 왔고, 이런 참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네트워크 업계 전체의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투여한 노력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선도적인 브로드밴드 국가로서 많은 다른 나라들의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현재 위상이고 보면, 데이터 네트워크 진영에서는 이 점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전진이 정작 네트워크 업계에 아무런 파급 효과를 주지 못한다면, 네트워크 업계가 모두 사표를 내던지, 아니면 이름을 NGBN(Next Generation Broadcast Network)로 바꾸든지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
지금 뜨는 기사
이시각 헤드라인
ZDNet Power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