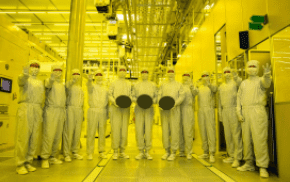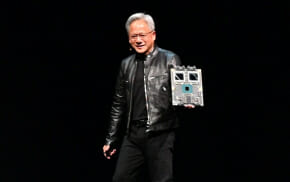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CCTV 관제센터로 해결하려 해왔다.
200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지능형 CCTV 기술력이 중국보다 앞서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 제약으로 현재는 중국보다 2∼3년 인공지능 CCTV 기술이 뒤처져 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정보를 가명정보(이름, 연락처, 나이, 이메일 등)화하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CCTV 영상정보를 마스킹 처리해야 하고, 영상정보를 딥러닝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CCTV 영상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에 산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30일이 지난 영상정보는 매일 자동으로 폐기, 데이터 자원 낭비가 이뤄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산업에 제한적인 범위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지능형 CCTV 기술 딥러닝으로 진화
지능형 CCTV 기술은 3단계로 진화했다. 초창기 기술은 모션 움직임 변화를 감지해 알람을 울리는 방식(과도하게 빈번한 알람이 발생)이다. 두 번째는 관찰자가 요구하는 규칙을 미리 입력시켜 놓고, 해당 규칙이 충족되면 알람을 보내오는 방식(현재 지능형 CCTV에 상당수 적용)이다. 예를 들어 모자에 마스크를 쓴 사람, 동일한 인상착의 사람이 일정 시간 지속으로 노출하면 알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움직임 및 사전에 적용한 규칙에 따라서만 알람이 발생, 다양한 도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도입됐지만 운영 공무원들이 외면, 활용이 저조한 이유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딥러닝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딥러닝 방식은 방대한 영상을 학습시켜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고, 지속적인 데이터셋 학습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이러한 CCTV 인공지능 기술은 관제요원의 보조적인 역할까지 수행 가능한 자동 관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민관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면 글로벌 투자기업 나올 수 있어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활성화해 신산업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게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AI 영상 학습센터'를 추진했는데, 이를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영상 학습센터'가 만들어지면 AI 기업들이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영상정보를 학습 할 수 있고, 빠르게 발전하는 시각 인공지능 기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AI 영상 학습센터'의 하드웨어(HW)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학습된 데이터셋, 엔진과 라이브러리는 클라우드 승인 절차를 통해 반출, 개인정보보호 침해방지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관련기사
- 지능형 CCTV로 재난·학교폭력 막는다…정부 2.3억 지원2020.03.15
-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로…‘AI+CCTV’로 범죄 예측 가능해진다2020.03.15
- "개인정보보호법 다 지키면 CCTV·드론 못 쓴다"2020.03.15
- "지능형 스피커·CCTV 노린 사이버공격 위험 커진다"2020.03.15
이러한 'AI 영상 학습센터'를 행정안전부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관 협업 모델로 공공 데이터생태계를 지원하는 글로벌 최초 투자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향후 해외로 수출도 가능하다.
또, 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 외에 교통정보, 범죄정보, 기후변화 대응, 공공서비스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융합한 데이터를 다양한 첨단정보기술 분야(5G, 자율주행차, AR 등)에 활용해 지자체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국가는 스타트업 육성부터 대규모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